
작년 8월 폭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 안이 지난달 15일 폐가 상태로 방치돼 있다. 나광현 기자
올여름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가 예고됐지만, 반지하 주택의 인명 피해 위험이 여전하다.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한 지난해 반지하에 사는 시민들이 고립된 채 희생되는 참변을 겪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서울시가 떠들썩하게 내놓은 이주 유도책은 실행이 더디기만 하다.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어김없이 재현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8월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3명이 희생됐던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을 다시 찾은 본보 취재팀에 따르면 비극 직후 반지하 수요가 급격히 줄긴 했으나, 얼마 안 가 되살아났다고 한다. 더 나은 거주여건을 찾지 못한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왔고, 원주민이 나간 자리는 조금이라도 더 싼 집이 필요한 청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또 다른 취약계층이 채웠다.
폭우 직후 서울시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지급했지만, 금액은 적고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서울시 관내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2만8,000호 중 바우처 지원으로 이주한 가구는 970호(3.4%)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긴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적으니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시가 매입한 반지하 다세대 주택은 98호에 그친다.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 반지하 피해가 반복될까 조마조마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위험이 코앞에 닥친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해 차수막과 개폐식 방범창 설치, 배수시설 점검 등 당장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지상층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반지하 자연 소멸을 유도해야 함은 물론이다. 'Banjiha'를 고유명사로 써가며 주거약자에 집중된 한국의 폭우 피해를 비중 있게 다뤘던 지난해 외신 보도는 뼈아팠다. 같은 보도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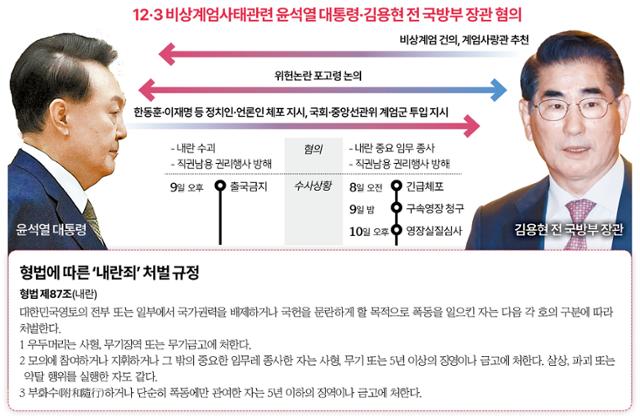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