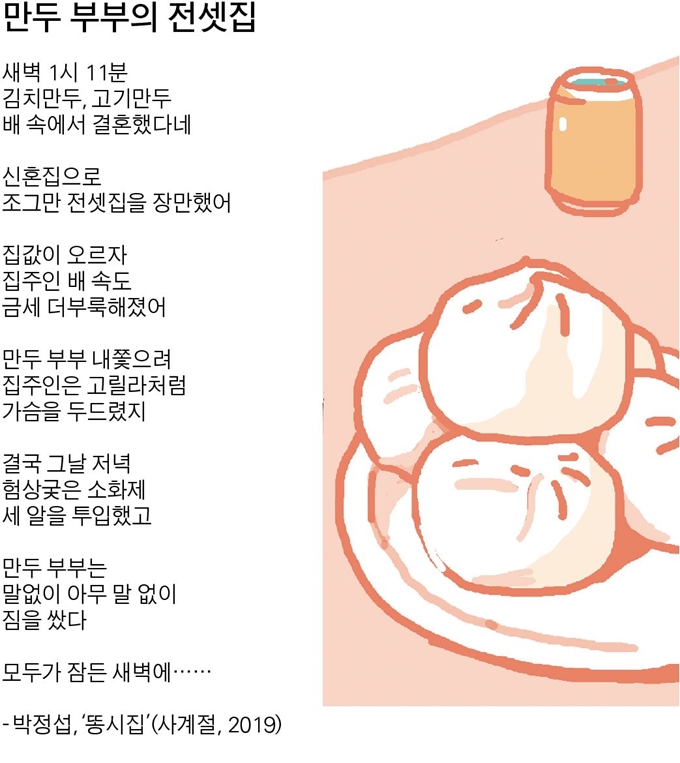
책 제목에 ‘똥’이 들어간 동시집을 좋아하지 않는다. 추함의 미학 같은 것하곤 전혀 상관없는, 어린이 독자를 핑계로 한 무분별한 마케팅 기법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그렇다. 단지 어린이 독자 ‘핑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 질문 때문이다. 첫 번째 질문. 유아기를 지난 어린이가 정말로 똥이 제목인 책을 선호하는가? K-POP 등 어른과 똑같은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요즘 어린이들이? 두 번째 질문. 설령 어린이 독자가 선호한다 하더라도 책 제목을 줄곧 똥으로 내는 건 바람직한가? 그것은 동시와 동화가 ‘문학’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일 아닌가? 앞의 두 질문에서 나아간 세 번째 질문. 어린이 독자에게 똥이 ‘먹힌다’고 보거나, 그렇든 말든 계속 똥을 주는 게 어른이 어린이를 타자화한 시선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어린이책을 만드는 작가와 편집자가 어린이 독자를 대상화하고 있다면 참담하고 부끄럽지 않나?
이 시집은 나아가 제목을 아예 ‘똥시집’으로 붙이고는 ‘동시’를 ‘똥시’로 만들고 있으니 우선 놀랍다. 하지만 왜 ‘똥시집’인지 이유를 ‘작가의 말’ 격인 첫 페이지와 마지막 겉표지에 두 번이나 말해둔 걸 보면 그럴 법한 설명이란 생각이 든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뭐랄까. 먹고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제 일상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를 거쳐 또 다른 결과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똥시집의 출발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몸과 마음을 거쳐 굵은 똥, 아니 멋진 시로 다시 태어나죠. 저는 거기에 ‘똥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즉 작가의 ‘똥시론’이다.
박정섭 작가는 잘 알려진 그림책 작가이고, 그림책 ‘검은 강아지’에 CD와 QR 코드로 음악과 영상을 함께 싣는 등 뉴미디어를 적극 이용한 창의적인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그의 ‘똥시론’에 따른 ‘똥시’ 역시 시, 음악, 영상이 한데 묶여 탄생한 건 당연한 일. ‘똥시집’에는 동시 40편과 그의 일러스트가 실린 건 물론 ‘똥시’에 그가 작곡, 노래, 연주한 7곡과 연주곡 2곡이 실려 있다. 많은 동시가 노래로 불리지만 동시와 노래를 하나의 출판 미디어로 동시 출간하는 작업은 흔치 않다. 그의 ‘똥시’가 어린이 독자에게도 새로운 시와 노래를 탄생시킬지, 기대와 흥미를 갖고 지켜볼 참이다.
김유진 어린이문학평론가ㆍ동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