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조와 정조 이후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역사비평사ㆍ288쪽ㆍ1만5,000원
1800년 6월, 마흔 여덟의 나이로 정조가 눈을 감았다. 여든 둘로 장수한 할아버지 영조에 비하자면 짧은 생이라지만, 영조가 조선의 왕 중 제일 오래 산 왕이었고 27대에 걸친 조선 왕의 평균 사망 나이가 마흔 여섯이란 점을 감안하면, 정조는 평균을 좀 넘는 생을 살다 갔다. 그런 왕 하나 죽었을 뿐인데, 정조 사후 조선은 빠르게 무너져간다. 세도정치, 가혹한 착취, 그리고 민란으로 특징 지워지는 19세기 조선사는 ‘악랄하고 간교한 일제’ 탓 할 것 없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린 ‘조선 붕괴사’이기도 하다.
자학사관이건, 식민사관이건 간에 우리 역사인식은 무조건 자랑스러워야 하기에, 우리는 그저 왜란ㆍ호란 양란을 줄기차게 극복한 가운데 영ㆍ정조대 중흥기가 출현했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그런데 그토록 찬란했다는 ‘중흥기’ 직후에 닥쳐온 것은 ‘추락’이다. 그 뛰어난 정조가 24년 재위기간 동안 그렇게나 어르고 달래고 매만져놨다는데 곧장 나락이라? 너무나 큰 이 격차 때문에 계속 입 안에 고이는 질문은 이것이다. “정조,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이오?”
정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도 여전한 ‘강력한 개혁군주’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다. 호학(好學) 군주요, 임금이자 동시에 스승인 군사(君師)임을 자처하면서 거침없이 국사를 챙겨나간 듯 보이는 정조는 이런 열망에 적합한 소재였다. 2009년 공개된 노론 영수 심환지에서 보낸 비밀어찰에서 드러난 ‘음험한 마키아벨리스트로서 정조의 민낯’조차 그 열망에 자연스레 포함됐다. 자기 스스로를 ‘만 개의 강을 비추는 밝은 달’(만천명월주인옹ㆍ萬千明月主人翁)이라 일컬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유교적 이상과 포부를 표현한 것이라 해도 닭살이 확 돋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 또한 ‘강력한 개혁군주’라는 역사 판타지에는 유용한 소재인 것을.
‘정조와 정조 이후’는 이 역사 판타지에 대한, 학자 8인의 건조한 응답이다.
사실 이 혼란의 모든 원인은 정조 캐릭터 자체가 다차원적인 데서 온다. 가령 이경구(한림대)는 이렇게 지적해뒀다. “세도정치는 정조의 제반 개혁을 무산시킨 대표적 사례로 인식된다. 그러나 세도정치의 최대 설계자는 정조였다.” 정조는 재위 전반기 탕평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후반기에 갈수록 이런 경향은 축소됐다. ‘올바른 측근’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올바른 측근을 키워내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안동 김씨 가문 김조순의 딸을 왕가에 끌어들이고, 김조순에게 세자를 부탁한 건 다름 아닌 정조였다.
‘강력한 개혁군주’ 이상적 왕 꼽히지만
사후 나라가 급속히 무너진 이유는
학자 8인이 ‘정조 판타지’ 파헤쳐
과거시험 1,347편 직접 출제 등 권력 집착
사실은 세도정치 희생자 아닌 설계자
“후대가 정조 역량 못따라온 결과” 해석도
호학 군주로 학문이 깊어 사대부의 스승을 자임하면서 군주도통론을 주장했다는 대목은 또 어떤가.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문체반정’으로 유명한 이데올로기 탄압이다. 꼬장꼬장한 성리학적 원론을 들어 새로운 사상 조류를 엄격히 통제했다. 오수창(서울대)은 정조가 직접 과거 시험에 개입한 사례를 꼽는다. 정조는 모두 1,347편의 문제를 냈으니 재위기간 평균 연 58.6편의 문제를 냈다. 설사 백보 양보해 정조의 문제의식과 적극적 행동이 100% 절대선이었다 해도, 이런 행보가 인재사랑이기만 한 걸까 아니면 강력한 사상통제이기도 한 걸까.

노대환(동국대)은 또 흔히 정조의 개혁 정책이라 불리는 장용영과 규장각 설치, 초계문신제 또한 양면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조의 개혁이라면 다들 왕권강화를 통한 국가부흥정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장용영은 “정조의 사적 기구라는 성격”임에도 “국가 재정이 전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장용영 유지 비용 때문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조도 분명 알고 있었다.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이서구 역시 이 사정을 잘 알았기에 정조 사후 장용영을 서둘러 폐지했다. 국왕 친위 세력 양성을 위해 만든 규장각과 초계문신제 역시 비슷하다. 정조의 신임을 듬뿍 받았던 정약용조차 “임금의 사인(私人)이 되어버리니 좋은 법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정조는 대체 어떤 국왕인가. 냉정하게 말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 나름의 활동공간을 찾으려 노력한 임금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오수창은 이리 적어뒀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직접 치밀하게 이끌었던 정조의 정치는 자신과 같은 역량의 군주에 의해서만, 혹은 시대적 모순이 점점 커짐에 따라 자신보다 더 큰 역량을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군주가 계속 나올 수는 없었다.” 조선의 정조라 해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나쁜 황제의 딜레마’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정조 이후’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다. 조선이라는 왕조국가가 그 생명을 다해가면서 밟아나간 과정에 불과했다. “19세기 세도정치는 조선 후기 정치사가 전개되어 간 끝에 귀결된 정치 형태”일 뿐이며 그것은 “정조 개인의 역량과 성실성, 그가 거둔 개혁정책의 성과와 모순되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생명이 다한 왕조 ‘너머’를 내다볼 수 있는 이가 없었다는 것뿐이다. ‘강력한 개혁군주’ 정조라는 환상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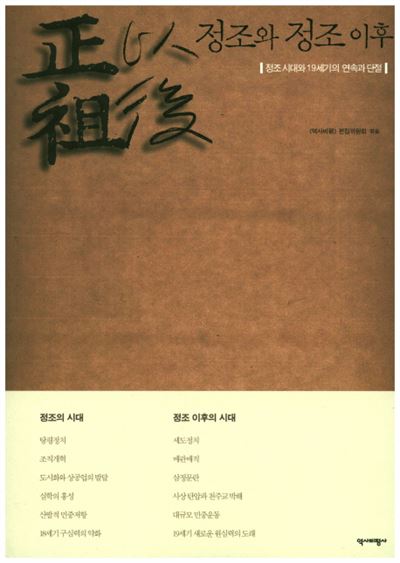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