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00억’ 메모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불법 자금의 상속까지 인정하는 게 옳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지급판결을 내린 건 의미가 작지 않다. 많아도 1억 원인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올린 것도 전향적이지만, 4조 원이 넘는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고 이 중 35%를 줘야 한다고 결정한 건 SK(옛 선경)의 성장 배경과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 회장의 보호막과 방패막이 역할로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와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도 결정적 증거로 등장했다. 그의 비자금이 1990년대 SK로 넘어 가 종잣돈이 돼 실질적 도움까지 줬다고 인정한 것이다.
‘세기의 이혼 소송’은 추측으로 돌던 권력과 기업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줬다. 더구나 SK로 유입된 300억 원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엔 드러나지 않았던 돈이다. 노 전 대통령이 추징당한 2,628억 원과도 별개다. 새롭게 나온 불법 자금인 만큼 수사하고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당사자마저 숨져 수사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불법 자금의 상속까지 인정하는 게 옳은지도 의문이다.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 있긴 하나, 아버지의 비자금과 압력 지원을 인정받아 지급 판결을 얻어낸 결과물을 온전히 노 관장 소유라고 하긴 힘들다. 재판부도 인정한 부정한 돈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는 방안이 강구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 돈도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왔을 게 분명하다.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외친 아버지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노 관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은 물론 도덕과 사회 정서까지 무시하는 대기업 총수의 일탈과 정경유착의 폐해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경유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 재계도 “권력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인 척하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경유착은 당사자들에게도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교훈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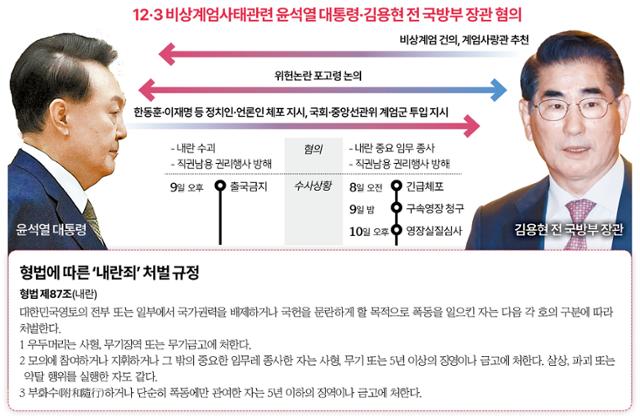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