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사진엽서, 시와 이미지의 문화정치학

조선 아이들이 지게를 매고 꽃을 파는 모습의 사진. 일제 카메라에 의해 연출된 사진일 가능성이 크다. 출판사 제공
일본 카메라는 조선을 왜곡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엽서를 보자. 조선 아이들 세 명이 지게에 실린 꽃을 팔고 있다. 사진 하단에는 ‘조선 풍속, 화매(花賣)’라고 적혔다. 관광객에게 꽃을 파는 이 아동 노동 풍속은 실제였을까. 저자는 “한국어나 중국어 사전 어디에서도 화매나 꽃 팔기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누가, 어떤 목적에서 현실을 비틀었나. 사진엽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식민지 조선에 관광 와서 사 가던 기념품이다. 일본의 우월성을 고취시키고, 식민지 조선을 깎아내리는 '기획 상품'이란 얘기다. 저자인 최현식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활짝 웃는 모습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명명된 ‘착한 미개인’이라는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될 법하다”고 했다.

일제 사진엽서, 시와 이미지의 문화정치학ㆍ최현식 지음ㆍ성균관대 출판부 출판ㆍ768페이지ㆍ4만 원
‘일제 사진엽서, 시와 이미지의 문화정치학’은 가로 14㎝, 세로 9㎝ 사진엽서에 숨겨진 일제의 복잡한 욕망을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단품 엽서보다 서사적 구성이 가능한 사진엽서 세트를 연구해 일제의 현실 날조ㆍ변형ㆍ과장과 축소 과정을 드러낸다. 방대한 자료, 문학평론가인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일제의 폭력성과 위선은 씁쓸하다.
일본인에게 식민지 조선 엽서는 인기 만점이었다. 조선 경성에 있던 히노데상행, 일본 와카야마현에 있던 다이쇼사진공예소가 이 분야 큰 손. 히노데상행은 조선 풍속ㆍ명소 사진 원판 1,300여 개를 소유했고, 하루 1만 개가 넘는 엽서를 판매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남녀노소, 남대문 일대의 날렵한 전차, 육중한 한강철교 사진, 한글과 민요 등 거의 모든 ‘조선의 것’들이 일본에 볼거리를 제공했다.

조선 남성들이 낮잠을 자는 사진이 실린 엽서. 식민지 조선 남성의 게으름을 극대화한다.

평양 기생 양성소와 기생 사진이 담긴 엽서. 근대적 연예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 가부장 권력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엽서는 말한다. ‘일본은 우월하고 조선은 미개하다.’ 가령 조선 남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낮잠 자기, 낮술 마시기, 장기 두기 등 게으른 모습. 여성도 다를 바 없다. 빨래, 다듬이질, 물 긷기, 도리깨질 등 고된 노동 활동. 혹은 가슴을 훤히 노출하거나 몸에 달라붙은 치마를 입은 기생 사진. 모두 ‘야만적 조선은 발전한 일제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제국주의 논리를 강화한다.
다음은 ‘밤 팔기’라는 엽서에 적힌 조선ㆍ일본 여성 간 대화. “밤 사리요, 밤(조선 여성) / 한 되에 얼마요(일본 여성) / 얼마면 사시겟습니까 / 십오전이면 죠치요 / 좃습니다. 그릇 내오 / 되질을 잘하지 않으면 아니되오.” 조선 밤이 맛있다는 홍보용 엽서가 아니다. 조선인은 상도덕이 부족해 ‘정확한 되질(계산)’을 의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깔렸다. 우아한 일본인의 옷차림, 남루한 옷을 입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밤을 파는 조선인의 대비는 그 편견을 강화한다.
조선 왕조의 상징이던 창경궁도 엽서의 볼거리로 박제됐다. ‘아기 보기와 창경원 풍경’ 엽서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전락한 창경궁 사진이 실렸다. 몰락한 왕궁은 무너진 조선 권위를 상징한다. 금강산과 경주 불국사는 비교적 세련되게 연출했는데, 일제의 ‘정복욕’ ‘승리욕’을 채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조선을 조롱하기에 앞서 서양의 놀림을 받았다. 서양 사진 작가들은 근대화 전 일본을 찾아 하급 무사, 목이 잘린 사무라이, 농염한 게이샤, 뙤약볕 아래 일하는 농부와 어민을 촬영하고 수집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후발 근대국가로 거듭난 일본은 자신들이 당한 짓을 조선에 풀며 ‘서양인’의 위치에 올라선다.

밤 파는 조선인 여성과 구매하는 일본인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림엽서(왼쪽). 조선 창경원 동물원, 식물원 사진이 담긴 엽서.

남산 조선신궁에 참배를 가는 조선인을 담은 사진엽서. 대부분 조선 아동들이 사진에 담긴 이유는, 이들이 일제의 '교화' 및 '동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진엽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다. 일본이 남산 신사 '조선신궁' 건립 10주년(1937년)을 맞아 발행한 사진첩 ‘은뢰’(恩賴ㆍ일왕의 은혜). 사진에서 남산 조선 신궁은 숭고하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연출된다. '이등국민 조선인이여, 제국신민이 되어 풍요를 누릴 지어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미일 전쟁이 달아오르던 시기에는 아예 진주만 폭격기, 식민지 병정 엽서를 통해 군국주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집요하게 조선을 날조하고 착취하려 한 일제에 저항한 이들이 있다. 저자는 “조선적인 것들에 대한 진정한 호소와 연대를 발휘했던 그 이름들을 기억해 두자”고 제안한다. 폭력적 시대조차 왜곡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본다. 신채호, 김소월, 현진건, 염상섭, 나운규, 채만식, 이태준, 박태원, 이상, 김유정, 김남천, 김사량, 백석, 서정주, 이용악, 오장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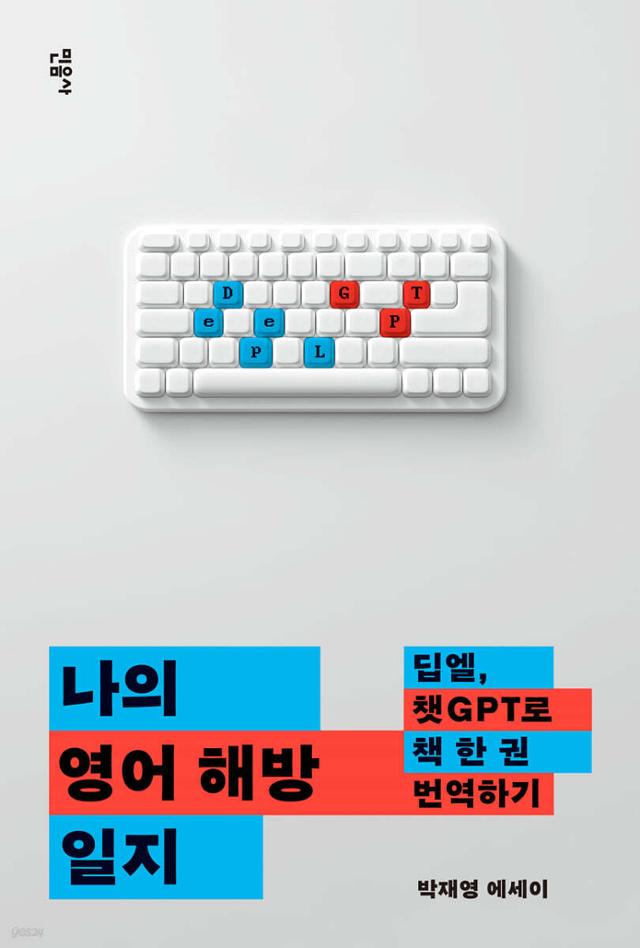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