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안정신?외과 전문의
편집자주
의료계 종사자라면 평생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한 기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생명을 구한 환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에게 각별한 의미를 일깨워준 환자일 수도 있다. 아픈 사람, 아픈 사연과 매일 마주하는 의료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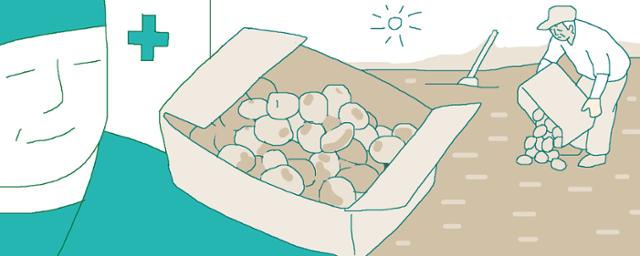
오래 전 외과 전공의 시절, 새벽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다. 전화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장암 수술을 한 80대 할아버지 환자가 집에 가겠다면서, 수액라인과 비위관을 다 뽑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주치의를 맡고 있던 환자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모두 달려들어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센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 나더러 빨리 와보라고 했다.
연세가 많으신 환자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 중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헷갈려서 그런 것이라면? 아마도 섬망 증상(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상태의 혼란)일 확률이 높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처방을 할 약을 머릿속에 그리며 중환자실로 내려갔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내 예감이 빗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도저히 섬망이 있는 분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라리 분노에 찬 얼굴이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겨우 침대에 앉힌 뒤 대체 무엇 때문에 주사 라인을 다 빼고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지 여쭸다.
“의사 양반, 들어보시오. 내가 80이 넘어서 이러고 있는데 살면 얼마나 살것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침묵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다독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여태껏 그곳에서 살아왔다. 고랭지 채소인 배추와 감자를 평생 키우며, 그걸로 생계를 꾸리고 자식들도 키웠다. 농사 열심히 짓고, 힘도 세고, 지금까지 아픈데 없이 병원에 간 적도 없었다. 그런데 대장암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됐다. 평생 논밭에서 농사짓던 분이 한 달째 중환자실에 있는 건 너무도 고역이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걸로 봤을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바에야 고향에 가서 죽겠다, 내가 안 돌보면 아무도 키울 사람이 없는 감자도 너무 걱정된다, 그거 심어놓고 캐지도 못하고 왔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졌다.
“할아버지, 왜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의사양반, 그럼 내가 살아서 고향에 갈 수 있것소?”
난 여기서 잠깐 고민했다. 암수술 후 장이 회복되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한 달째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지 않는가. 이런 분한테 신참 전공의가 경과가 좋다고 말씀 드리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질문하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함으로 흔들리는 걸 보는 순간 난 생각했다. 그래, 지금 이 할아버지께 필요한 것은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구나!
“할아버지, 살아서 갈 수 있어요, 꼭 건강히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양반, 내가 암환자인데, 보장할 수 있소?”
“보장할게요. 믿어보세요. 집에 가시기 전에 낫고 가야죠, 그냥 가시면 힘들어서 다시 병원 오실 거예요.”
난 할아버지의 경과가 좋아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다시 비위관을 삽입했다.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생체징후 모니터링도 재개했다.
다행히 오랜 대화 후, 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꿨다.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는 필요한 시술과 재수술 등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냈다. 경과가 좋아져서 일반 병동에 갈 수 있었고 컨디션도 점차 좋아졌다.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왔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퇴원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의국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열어보니 그 할아버지의 큰아들 내외가 박스를 들고 서 계셨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성화시던지 이걸 캐러 휴가내고 강원도에 다녀왔어요.”
감자였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던 효자 아들은 "아버지께서 의리가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 감자를 캐오라 하셨다"고 전했다.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아들은 감자 캐는데 꽤 고생을 했다고 한다. 막 캔 감자여서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큰 것과 작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시장가면 좋은 감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꼭 캐오라고 하셔서...드리면서도 미안하다”고 했다.
가끔씩 구내식당에서 감자메뉴를 접할 때면, 그렇게 아끼던 감자 선물을 안겨준 그 강원도 할아버지가 생각나곤 한다. 의학적 지식도 경험도 부족하고 바쁘기만 하던 시절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받으시길 설득했던 할아버지가 호전되어 퇴원하셨던 그날, 나는 마음이 벅차올랐고 의사인 것이 감사했다.

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신 의료인이라면 누구든 원고를 보내주세요. 문의와 접수는 opinionhk@hankookilbo.com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되며 한국일보 지면과 온라인뉴스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