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주 '우리가 쓴 것', 손원평 '타인의 집'
나란히 첫 소설집으로 독자 찾아

2010년대 한국 문학의 두 히트작을 써낸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왼쪽)와 '아몬드'의 손원평 작가. 민음사ㆍ창비 제공
2010년대 한국 문학의 '히트작'을 꼽는다면 ‘아몬드’와 ‘82년생 김지영’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출간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는 국내에서만 77만 부가 팔렸고 아시아권 소설로는 최초로 일본 서점 대상 번역소설 부문에 선정됐다. 2016년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국내 누적 판매량 100만 부를 넘겼고 27개국 25개 언어로 번역됐다.
공전의 히트작을 썼던 두 작가가 18일 나란히 신작 소설집(조남주 ‘우리가 쓴 것’, 손원평 ‘타인의 집’)을 내놨다. 두 작가 모두 장편소설이 아닌 소설집으로는 독자와 처음 만나는 것이다.
열세 살부터 여든 살까지…김지영의 과거와 미래
‘우리가 쓴 것’에는 2012년 발표한 단편 ‘미스 김은 알고 있다’부터 올해 발표된 ‘첫사랑 2020’까지 총 10년에 걸쳐 쓴 소설 8편이 실려 있다. 소설 사이 시간차는 10년에 달하지만 여성의 삶을 해부하는 작가의 천착은 일맥상통한다. ‘82년생 김지영’ 탄생 이전부터 가장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을 향한 작가의 관심이 꾸준하게 이어짐을 알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이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의 전 생애를 중심으로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합리를 진열했다면, ‘우리가 쓴 것’은 이를 조각조각 떼어내 각각 하나의 단편으로 풀어냈다. 말하자면 ‘82년생 김지영’의 확장판이다. 열세 살부터 여든 살까지, 다른 시대와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저마다 겪는 곤궁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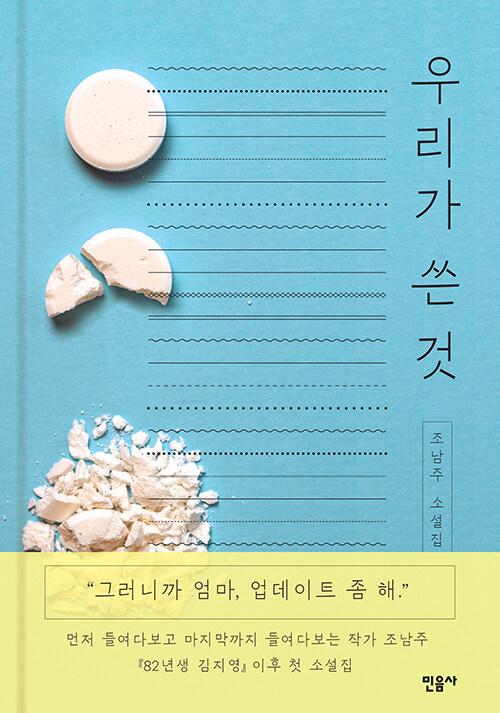
조남주 '우리가 쓴 것'. 민음사 발행. 368쪽. 1만4,000원
오늘날의 여성 청소년이 겪는 현실은 김지영이 성장했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지뢰밭이다. 단편 ‘여자아이는 자라서’의 중학생 주하는 같은 반 남학생들이 여학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성희롱 사건에 휘말린다. 한때 성폭력 관련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던 주하의 엄마는 그러나 주하를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는 남자애들은 생각이 없다, 이해해 줘야 한다, 몰래 사진 찍고 낄낄거리는 게 장난이다, 그러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엄마, 업데이트 좀 해.”
이외에도 10년 넘게 사귄 연인으로부터 겪은 데이트 폭력과 가스 라이팅을 고발하고(‘현남 오빠에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부당 해고를 당한 뒤 유령처럼 사라진 비정규직 여성을 가시화한다(‘미스김은 알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뒤늦게 탐구해나가는 여성 인물들을 통해 페미니즘을 둘러싼 고민은 노년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매화나무 아래’, ‘오로라의 밤’). 이처럼 다채로운 소설은 ‘페미니즘 작가’라는 수식이 결코 작가를 가두는 게 아닌 오히려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작가로 만듦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가족, 가장 가까운 타인
‘타인의 집’은 제목 그대로 ‘타인’과 ‘집’을 매개로 세계를 사유하는 소설집이다. 작가가 2017년부터 올봄까지 5년간 발표한 소설 8편이 실려 있다. 표제작인 ‘타인의 집’은 월세 인상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난 주인공이 대단지 아파트 전셋집 셰어하우스에 불법 월세 입주자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거주 불안정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인과 같이 살며 그들의 생리현상까지 알 수밖에 없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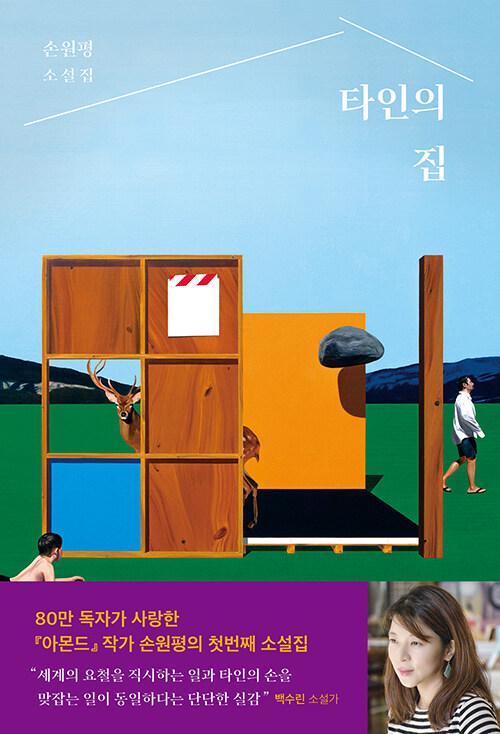
손원평 '타인의 집'. 창비 발행. 272쪽. 1만4,000원
심지어 월세의 차등은 개인 화장실 사용과 공동 화장실 사용이라는 계급 차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같은 계급 구분은 진짜 갑자기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의 ‘통보’ 앞에서 무용해진다. 작가는 한 집에 사는 타인들과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촌극 안에 부동산 계급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연스레 녹여낸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해서 타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으로부터 “어차피 그 여자는 몰라”라는 말을 듣거나(‘zip’), 내가 낳은 쌍둥이 아들이 “아빠를, 죽일 거야. 오늘, 저녁. 우리 손으로”라는 메모를 남긴 것을 보고 불안에 휩싸인다(‘괴물들’).
때로는 또 다른 낯선 타인의 방문을 통해 가장 가까운 타인인 가족과의 단절이 회복의 조짐을 드러내기도 한다(‘4월의 눈’). 평생 비혼으로 살아온 여성은 잠시나마 가족 되기를 꿈꿨던 이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게 된다(‘아리아드네 정원’). 가족은 어쩌면 가장 먼 타인일지도 모른다는 작가의 전제는 때로는 비극적이기도, 때로는 희망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희비극의 혼재야말로 “섣부른 낙관이나 손쉬운 냉소”보다 더 명징한 결론처럼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