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농촌의 앞날을 우려하는 이가 많다. 농사로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마을에는 노인만 남았으니 지금 농촌에서 밝은 미래를 그리기는 쉽지 않다. '지방소멸론'도 힘을 얻는다. 젊은 여성은 드물고 고령인구는 늘어가는 '소멸위험지역'에 국내 대표 농업 시군들이 속한다.
반대로 농촌의 재생을 기대할 사례도 있다. 경남 함양군 서하면은 폐교 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고자 주민, 학교, 지자체가 협력해 '학생모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성화 교육을 도입하고 학부모에 주거·일자리를 알선, 지역 정착을 도와 학교 살리기와 인구 유치에 성공했다. 경북 의성군은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통해 창업과 살아보기 체험을 지원하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100명 넘는 청년을 유치했다. 청년 창업도 10곳을 넘었다. 모두 '소멸위험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농촌 재생을 기대할 증거는 더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농촌 마을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인구 유입이 근교 농촌에 한정되었다. 요즘은 원격지역 마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촌은 창업활동 무대이기도 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창업 업체 증가율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마을의 진화'라는 책에서 국내에 소개된 일본 시코쿠의 산골 가미야마에서는 창조인력 유치, 창업 지원 등 혁신적 실험이 진행되어 도쿄 등지에 본사를 둔 16개 기업의 위성사무소가 설립되었다. 이런 혁신 창출 잠재력은 우리도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5년 내에 버킷리스트 실행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31%였고, 그중 45%는 농촌을 무대로 희망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도시민의 14%에 해당하며 '창조인력' 다수가 포함된 집단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 농촌 재생이 지속성을 갖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도농 상생'을 들 수 있다. 도시의 버킷리스트 실행 희망층과 인적 자원에 목마른 농촌을 잇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은 균형발전의 선도 공간이 될 수 있다.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의 대통령 기념사에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제공,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이 언급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농촌 활성화가 농업인과 농촌 주민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한 것이다.
농촌 재생을 이어갈 둘째 조건은 농촌다운 공간을 유지하고 가꾸는 일이다. 국민들은 농촌에 식량 생산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지닌 거주?여가 공간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농촌을 농촌다운 곳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계획과 제도가 없다. 주거환경과 농촌다움을 훼손하는 시설이 곳곳에 들어선 배경이다. 농촌 재생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삼아 농촌 환경?경관을 보전하는 주민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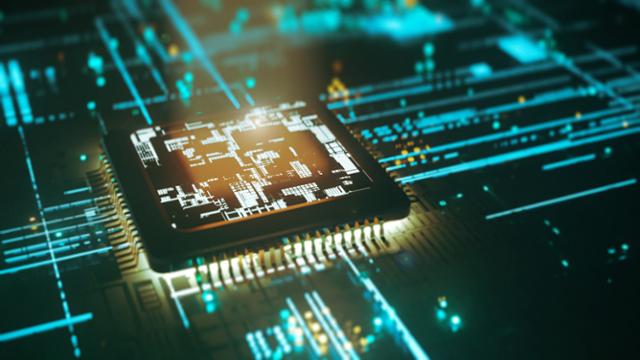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