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빈곤이 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사각지대 해소,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인상, 수급권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12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진입하고 4만달러를 고지에 둔 한국을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 드러난 지표상으론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의 절반은 자신이 저소득층이라 여긴다. 당장 헐벗고 배 곪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까마득한 노후대비까지. 많은 사람들은 늘 돈에 쪼들리거나 허덕인다.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30년 간 연구해온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신간 ‘빈곤이 오고 있다’(개마고원)에서 “빈곤이라는 이슈는 15%에 해당하는 저소득가구의 문제만 이 아니라 서민 대중 모두의 문제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빈곤은 ‘소득’이란 손쉬운 기준으로 규정되기 일쑤다. 하지만 저자는 빈곤을 “정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수급자 집단의 생명과 생계 유지 문제”를 넘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정한 수준으로부터 멀리 밀려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가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란 말처럼, 빈곤은 모든 차별과 불평등의 시작이다. 단순히 낮은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에서 더 잘 다치고, 더 자주 아픈 상태로, 고른 교육의 혜택을 못 받으면서 외롭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보다 빠르게 죽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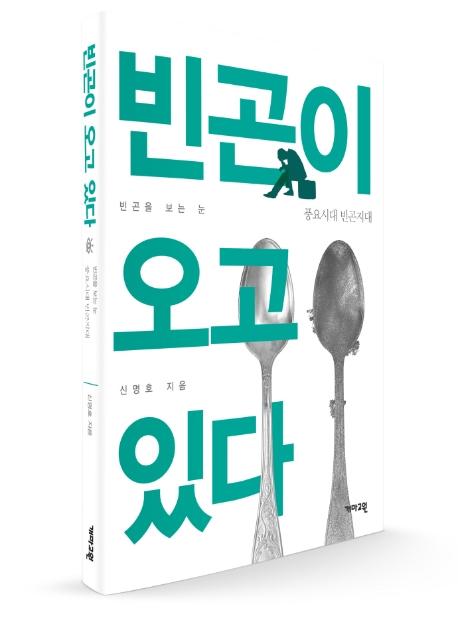
빈곤이 오고 있다ㆍ신명호 지음ㆍ개마고원 발행ㆍ296쪽ㆍ1만5,000원
한국의 빈곤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2019년 기준 한국(17.4%)보다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남아공(26.6%), 코스타리카(19.9%), 루마니아(17.9%), 미국(17.8%)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빈곤율은 12.5%다. 풍요로워질수록 빈곤은 심화됐다. 1990년대 말 8.5%였던 한국의 빈곤율이 2배로 증가하는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 커졌다. 빈곤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추기, 사회보험 대폭 강화 등등의 대책은 새롭지 않다. 결국 중요한 건, 빈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 부재’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고, 적어도 나는 저만큼은 힘들지 않으니까 상관 없다는 식의 방관과 거부는 더 큰 빈곤을 낳을 뿐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이미 웬만큼 극복했다고 여겼던 빈곤이 어느 결엔가 우리 코앞에 닥쳐와 있음을 경고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적었다. 남의 빈곤에 눈감으면 어느새 빈곤은 나에게도 덮쳐올지 모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