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노동이 일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대면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정부가 지난주 보건의료ㆍ돌봄 노동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같은 대면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꼽고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를 출범한 이유다.
□노인과 장애인 수발, 간병, 아이 돌봄과 같은 복지 수요의 공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대표는 돌봄노동자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요양보호사, 장애인돌보미 같은 돌봄노동자들의 취업률은 전체 취업자보다 8배가량 높았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38만명, 아이돌보미 2만3,000명, 간병 인력은 2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쓴 이들의 노동 덕분에 코로나 사태에도 많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취약 가구가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열악한 처우다. 돌봄노동자들(사회복지서비스업ㆍ2017년 기준)의 급여는 174만원, 근속 연수 3.2년, 유노조 사업장 2.6%로 일반서비스업(299만원, 5.4년, 12.0%)에 크게 못 미친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가 인적자본 투자로 경제 성장을 꾀한다는 ‘사회투자 국가’ 전략을 세우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 이래 이 분야의 규모는 날로 커졌다. 하지만 정작 핵심 노동자인 돌봄노동자들은 지금도 저임금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영역이 서비스 공급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돌봄노동자들과 화상간담회를 갖고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문제 의식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공공 영역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ㆍ고용 안정ㆍ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연내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관련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야당은 민간 영역과의 역할 분담 모호, 사회서비스원의 ‘코드 인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 제정에 미온적이다.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한국형 공공 돌봄노동’이 안착할 때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아직은 높아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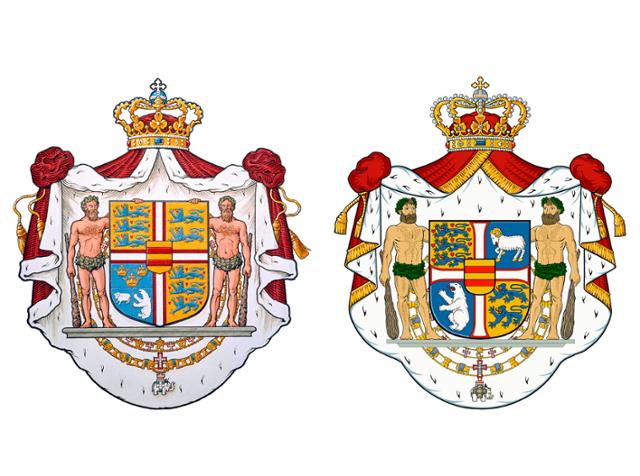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