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 대비 총지출)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복지 예산 확대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현 정부 들어 국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배경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건전 재정 관리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어렵게 내놓은 준칙마저 국제 기준에 비해 느슨하고 예외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목표 지표를 유럽연합(EU) 권고기준에 맞춰 ‘국가채무 60%와 재정수지 적자 3%’의 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기준의 동시 충족이 아니라 종합 고려한다는 식으로 기준을 낮췄다. 예외 허용 상황도 논란이다. 경기 둔화로 판단될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완화하는 데다, 예외 기준마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처 마련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해 정부가 쉽게 재정준칙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준칙을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도 현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직전 3개 정부 국가채무 증가는 140조~180조원 수준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5년간 채무 전망치는 417조원에 달한다. 국채 비율도 2025년이면 60%에 근접해,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은 선택 폭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정준칙이 사실상 선언에 그친 것은 제정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8월 발표키로 한 준칙은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가까스로 나왔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손봐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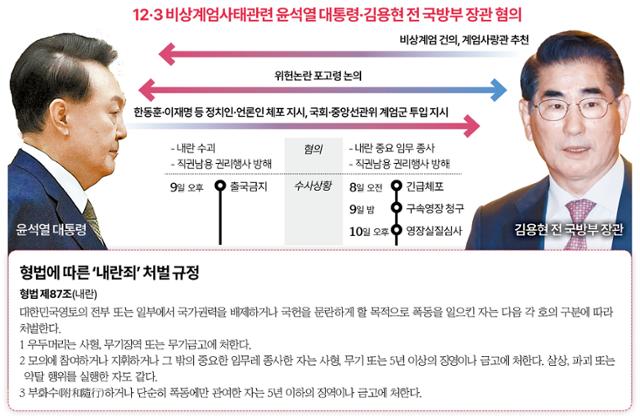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