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경제 서비스 '우버이츠'의 종사자가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실업자였던 사라(29)는 "일정을 마음대로 짤 수 있고, 일감도 제법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공유경제의 매력에 단기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태스크래빗'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용돈벌이였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 90%가 됐다. 사실상 생업이었다. 얼마간 돈을 모은 사라는 푸에르토리코 섬으로 생애 첫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생겼다. 태스크래빗에서 들어오는 일감에 대해 30분 안으로 수락 여부를 답해야 하고, 그 중 85%는 수락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 사라는 "대기하는 동안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막연히 일감을 계속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며 "예측 불가능한 내 일정에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대학생 바란(28)은 학교공부를 하면서 승차공유서비스 '우버'와 '리프트'의 기사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일해야 차량 유지비를 댈 수 있다. 이틀간 차량 대여료를 벌고 또 하루는 기름값을 벌면, 그 다음에 버는 몫이 수익으로 남는다. 수익을 올리려면 하루 꼬박 12시간을 일해야 할 때도 많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바란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는 "공유경제는 나를 '파트너'라 부르지만 ‘독립계약자’에 가깝다"며 "회사는 나를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들은 현재 미국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유경제 노동자의 삶이다. 저자는 공유경제 속 모순을 조명하기 위해 종사자 80여명을 인터뷰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4곳(에어비앤비ㆍ우버ㆍ태스크래빗ㆍ키친서핑)의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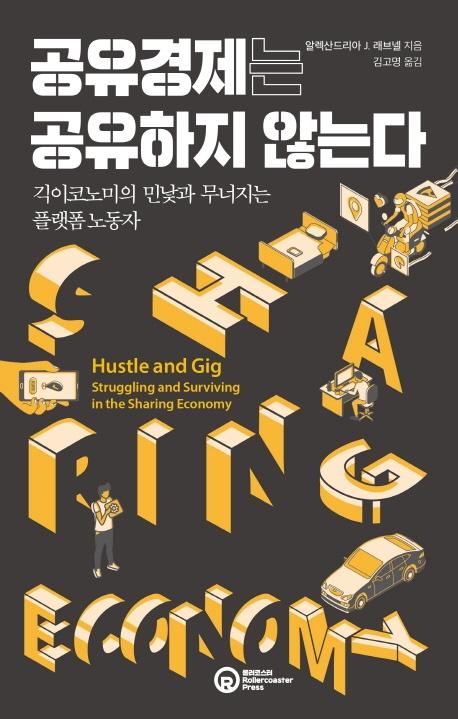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ㆍ 알렉산드리아 J. 래브넬 지음ㆍ 김고명 옮김ㆍ롤러코스터 발행ㆍ392쪽ㆍ1만8000원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플랫폼을 활용한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일하고 싶을 때, 벌고 싶은 만큼만 자유롭게 일하면 된다"며 젊은 노동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저자의 결론은 "오늘날 공유경제가 일으키는 파괴의 결과물은 위태로운 품팔이로 또 하루를 버티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예 공유경제의 근로방식을 초기 산업사회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빗댄다. 최소한의 휴식도 없는 장시간 근로에다, 일하다 다쳐도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으며, 노조를 결성할 권리조차 없었던 시대의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유경제 종사자들은 수 세대에 걸쳐 형성된 노동법 등의 보호에서 비껴나 있다.
공유경제에 부정적이면 플랫폼 서비스라는 혁신을 이해못한 바보 취급하는 시대에, 한 사회학자의 일침은 스마트폰 터치 속에 사라진 노동의 땀을 되새기게 만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