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편집자주
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첫손에 꼽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한국일보> 에 격주 금요일 글을 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수의 숲 속에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생활을 하면서 현대 물질문명을 경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도시에서 무언가를 ‘진짜’ 발견하기는 어렵다. 매일매일 할 일이 짜여있고, 짬을 내 빈둥거릴 시간이 없기에 자기 철학을 갖고 사는 일도 불가능하다. 남의 지시와 요구 사항에 응하고 행동해야 하므로 충만함을 느끼기도 어렵다. 나무바라기가 되거나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도 마땅치 않다. 차 소리에' 놓여나 완전한 자연에 둘러싸여 지내본 적인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바꿔 말하겠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는 약 2년 동안 월든 호숫가 근처에 혼자 살며 사유한 기록을 모아 '월든'을 냈다. 1854년의 일이다. 그는 고독을 벗 삼아 자연에서 사는 일의 행복, 자기 내면을 기준으로 충실히 사는 방식을 탐구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집이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겠지만,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은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평생 가난하게 지낸다.”(50쪽)
그에 따르면 행복은 무얼 갖거나 하기보다, 갖지 않기와 하지 않을 자유에 가깝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 때, 단순하고 가벼운 태도를 가질 때 오는 충일한 감정이 행복이란 얘기다. 이는 ‘혼자, 자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소로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든 호숫가에 지은 오두막. 한국일보 자료사진
“밤의 검은 핵은 어떤 이웃 인간에 의해서도 더렵혀지지 않는다.” (183쪽)
고독은 그가 입은 옷이다. 더럽혀질 일도, 빼앗길 일도 없다. 그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가진 게 없지만 그득해 보인다. 불행은 혼자라서 겪는 일이 아니다. 세상에 부대껴 ‘나’라는 존재가 깎여나갈 때 불행은 온다. 행복처럼, 불행도 상대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내 앞에 있는, 혹은 없는 당신 때문에 고통과 번민이 생긴다. 혼자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있는 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아직까지 고독만큼이나 편안한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방에서 혼자 지낼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롭다. 생각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다.” (189쪽)

월든ㆍ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ㆍ강주헌 옮김ㆍ현대문학 발행ㆍ476쪽ㆍ1만2,000원
'월든'은 19세기에 쓰여 21세기에 이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책이다. 그 이유가 뭘까. 소로와 같은 생활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에겐 도시에서 할 일이 있고(있다고 믿고), 자연을 좋아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느끼며, 혼자 있고 싶다지만 정말 혼자가 되는 일은 두려워하기 때문일까. 소로처럼 살아보고 싶지만 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삶의 동기를 찾아야 한다. 정말이다! 자연의 하루는 무척 차분해서, 인간의 나태함을 좀처럼 꾸짖지 않는다.” (157쪽)

헨리 데이비드 소로. 한국일보 자료사진
뉴스는 빠르고 구체적으로 세상 모든 일을 말해주려 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도 스마트폰을 켜면 낱낱이 올려져있는 세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 혼자 고독할 권리, (필요 없는 건) 알지 않을 권리,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혼자 그득해질 권리가 아닐까. 그것들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 책에 정답이 있다고 말할 순 없으나,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다친 정신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당신이 직접 책을 통해 찾아야 한다. 말랑한 책은 아니기에 반짝이는 눈과 능동적인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소로가 말한 “고결한 지적 운동으로서의 독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독서는 우리를 사치품처럼 달래며 그동안 우리의 고결한 능력을 잠들게 하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읽어야 하며 잠에서 완전히 깨어 정신이 가장 또렷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책을 읽는 것이다.”(143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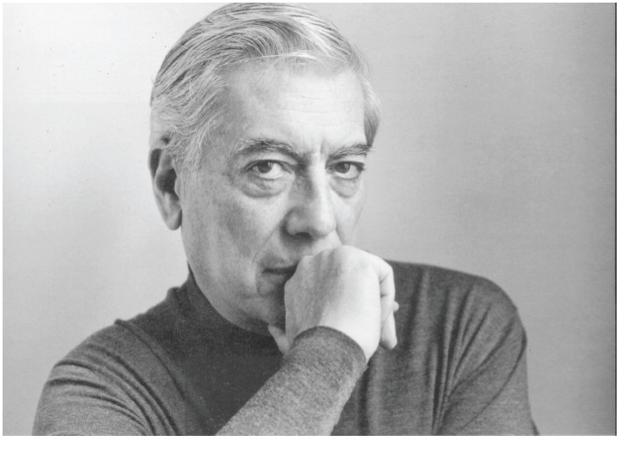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