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칠기삼(運七技三)이란 말은 일의 성패에 운이 7할, 노력이 3할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요즘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새삼 “신약 개발은 운칠기삼”이라는 업계의 말이 떠오른다. 앞다퉈 효능 있는 성분을 찾았다지만, 코로나에 맞설 신약 개발은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지(未知)와 우연의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다.
□ 신약을 찾고 만드는 인류의 행보는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어 걷는 것과 비슷했다. 태초에 약초와 독초를 가려 체계화했다는 전설 속의 신농(神農)씨도 ‘100가지 약초를 먹고 72가지 독초에 중독돼 쓰러졌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신농씨처럼, 고대 인류가 약을 찾아낸 건 선제적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수많은 식물(약리성분)을 직접 맛보고, 부작용의 고통 속에서 끝없는 ‘임상실험’을 감행한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시행 착오는 끝이 없었고, 좌절과 우연이 무수히 교차했다.
□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성공률 0.01%라는 현대 신약 개발 이야기를 담은 ‘약의 탐험가들’(세종 발행)의 저자 도널드 커시는 “21세기에도 신약을 찾는 근본 기술은 5,000년 전과 똑같다. 끈질기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화합물을 조사하며, 그 중 단 하나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정 화합물과 약효에 관한 고도의 논리적 산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연히 발견된 신약이 더 많다. 살균제로 개발된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없애는 과정에서 뜻밖의 진통 효과가 확인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진통제 아스피린이 탄생한 것처럼.
□ 신약 개발엔 불확실성만큼 사고와 혼선도 그치지 않는다. 1930년대 미국에서 성급히 사용됐다가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항생제 ‘술파닐아미드’에서부터, 최근 국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인보사의 경우, 먼저 제재를 가한 미국 FDA는 제약사의 안전성 확보 노력 등을 인정해 최근 임상 3상 진행을 다시 허용한 반면, 우리 식약처는 아예 품목 취소를 통해 개발 여지 자체를 말살해 버렸다. 신약 개발 규제는 좀 더 유연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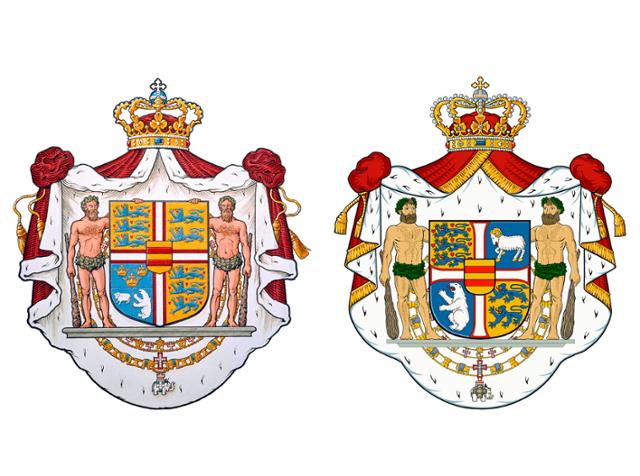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