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승 세계 여행을 주제로 한 단테의 대서사시 ‘신곡’의 1부 ‘지옥’은, 잠에서 깬 단테가 어느 어두운 숲을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산짐승들에게 위협을 당하던 단테를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구해주고, 단테는 그를 따라 지옥과 연옥으로 순례를 떠나게 된다. 이때 단테의 나이가 서른 다섯, 인생의 절정기이자 동시에 내리막길 앞에 선 시기였다. 단테는 “인생길의 한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 속을 헤매고 있다”고 서술한다. 어두운 숲은 단테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거쳐야만 했던 문이었던 셈이다.
니콜 크라우스의 장편소설 ‘어두운 숲’은 바로 이 단테의 ‘어두운 숲’을 새롭게 변주한다. ‘사랑의 역사’(2005)로 전미도서상 최종후보에 오르며 단숨에 미국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로 떠올랐던 크라우스가, ‘위대한 집’(2010) 이후 7년만에 발표한 신작이다. 촉망 받던 젊은 작가에서 어느덧 원숙한 중견작가가 된 크라우스가 작가 생활의 ‘어두운 숲’에서 자신의 문학적 여정을 되돌아보는 작품이다.
미국 맨하튼에서 태어난 유대인 작가인 크라우스는 소설에서 잊혀져 가는 유대인의 아픈 역사와 디아스포라의 상실감을 그려왔다. 이번 작품 역시 전작들처럼 유대계 미국인의 정체성 찾기가 소설의 큰 뿌리다. 이 뿌리에 뻗어 나온 두 기둥은 엡스타인과 니콜이라는 두 유대계 미국인이다. 남다른 열정과 성취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말년이 되어 삶에 깊은 회의를 느끼는 전직 변호사 엡스타인, 마찬가지로 성공한 소설가지만 결혼 생활의 실패와 창작의 벽에 부딪힌 니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유대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왔지만,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어두운 숲’에 당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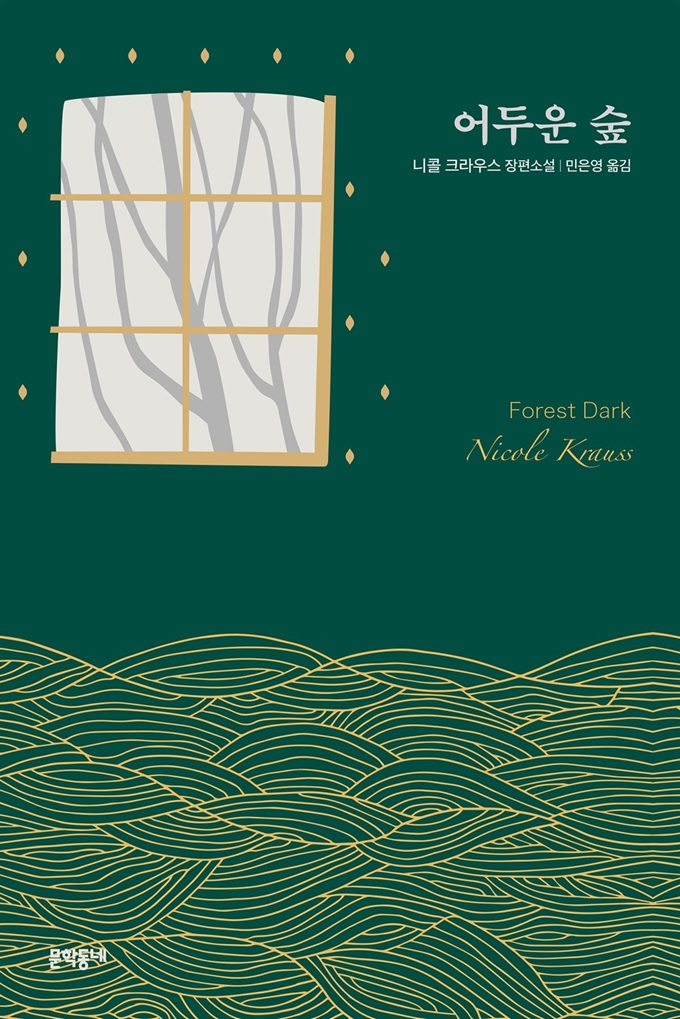
어두운 숲
니콜 크라우스 지음ㆍ민은영 옮김
문학동네 발행ㆍ368쪽ㆍ1만4,500원
개별 인물의 이야기가 따로 서술되다 소설 말미에 이르러 하나로 포개지던 전작들과 달리, 엡스타인과 니콜은 소설 안에서 끝내 마주치지 않는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뿐이다.
물질적인 욕구에 허망함을 느끼던 엡스타인은 자신의 재산을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나눠주기 시작하고, 재산이 바닥을 보일 무렵 남은 돈을 들고 자신이 태어난 도시 텔아비브로 떠난다. 니콜 역시 우연히 텔아비브의 힐튼호텔에서 떨어져 죽은 남자의 이야기를 접한 뒤, 글쓰기의 돌파구를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라는 막연한 희망에 휩싸여 텔아비브로 향한다.
텔아비브는 엡스타인과 니콜이 태어나고 잉태된 곳이자 동시에 그들이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엿보는 곳이다. 엡스타인은 그가 다윗왕의 직계 후손이라 주장하는 랍비에게 이끌려 다윗의 역사를 재해석한 영화에 늙은 다윗 역으로 출연한다. 니콜은 텔아비브 대학의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프란츠 카프카의 말년 비밀에 관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막으로 향하게 된다.
소설은 한편 작가의 자전적 메타픽션이기도 하다. 작가의 이름인 ‘니콜’이 그대로 쓰였다는 사실 이외에도, 결혼 생활의 실패를 겪은 점(크라우스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쓴 조너선 사프란 포어와 함께 뉴욕 문단의 유명한 작가 커플이었으나 2014년 이혼했다), 오랫동안 신작을 발표하지 못한 점, 유대계 작가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 써야 한다는 요구와 책임감에 시달려왔던 점 등에서 소설 속 니콜과 작가가 겹쳐 읽힐 수밖에 없다.

작가가 겪은 정신적 방황이 그대로 이어진 듯, 소설은 낯설고 캄캄한 숲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럽고 정처 없다. 꿈과 현실이 뒤엉키며 관습과 규범을 허문다. 특히 프라하의 유대인이었던 카프카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결핵 요양소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장한 뒤 이스라엘로 떠났다는 소설 속 가정은 역사적 사실(이라 알려진 것)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뜨린다.
카프카 일화는 단테의 ‘어두운 숲’과 함께 소설의 큰 알레고리로 작용하며, 어두운 숲을 통과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주인공들의 여정에 내내 드리운다. 그리고 이에 대해 크라우스가 니콜의 입을 빌려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아마도 이것이다.
“천국과 이 세상 사이의 문턱은 환상에 불과하며, 사실 우리는 천국을 떠난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 카프카의 생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바로 거기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