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서 위기감을 느낄 때 보수 야당이 꺼내는 전매특허가 ‘무릎 꿇고 읍소’ 전략이다. 결정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ㆍ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유세를 했다. 후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아 큰절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퍼포먼스’로 효과를 본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읍소 전략을 다시 꺼냈다. 황교안 대표가 막판에 무릎을 꿇고 지지를 호소했으나 식상하다는 비판만 받았다.
□ 통합당의 총선 참패는 황 대표의 허약한 리더십이 가장 큰 원인이다. 30년을 검찰에서 공안검사로 일한 그의 이력은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장관에서 곧바로 총리에 올랐을 때 법조계에서는 ‘관운은 타고난 사람’이라는 평이 많았다. 정치권 경력이 전무한 ‘정치 신인’인 그가 제1 야당 대표 경선에 당선됐을 때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삭발 단식 등 극한 수단을 택한 것도 리더십과 정치력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였던 셈이다.
□ 황 대표와 경기고 동기로 같은 반이었던 고 노회찬 전 의원은 그를 저항이나 비판 없는 ‘범생이’로 기억했다. “경기고 시절 대부분 학생들이 어용적 성격의 학도호국단 간부를 맡으려 하지 않았는데, (황교안이) 맡은 것 자체가 체제 순응적이었다.” 노회찬이 노동운동을 하다 구속돼 공안검사 황교안을 검찰에서 만났을 때 “서울구치소로 옮겨가 겨울에 덜 춥다”고 했더니 “거기 지을 때 구치소가 따듯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도 한다. 황 대표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 결핍이 ‘n번방 호기심’ 발언을 낳았다.
□ 총선 참패에 책임지고 당 대표를 사퇴하면서 황 대표는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쟁자’ 홍준표 후보가 “총선에서 황교안과 홍준표 둘 중 하나는 낙선해 집에 간다”고 말한 그대로 됐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뭔지 성찰하겠다”고 한데서 보듯 그가 대권의 꿈을 접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야당 인사 가운데 지지율 1위이고 별다른 경쟁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대선 후보로 다시 돌아와도 정치적 리더십을 채우지 않는 한 추락은 예견된 일이다. 강력한 리더십은 공감과 소통에서 나오는데 황 대표에겐 그게 결여된 탓이다.
이충재 수석논설위원 cj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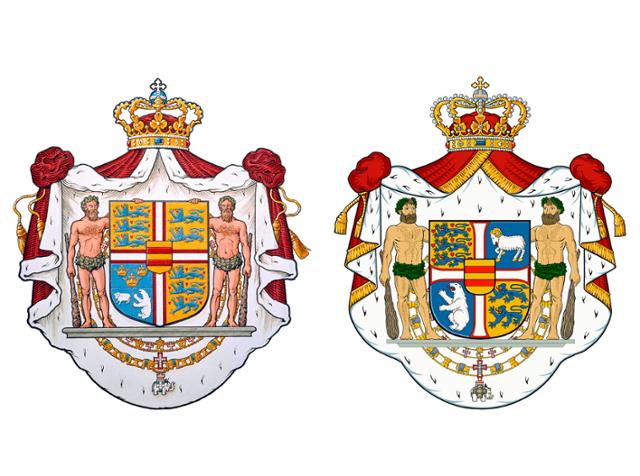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