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부족해 입원대기 들어가자 ‘타가격리’ 자처해 함께 생활

“일반인도 힘든 자가격리 14일을 장애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보다 혼자가 되는 것이 장애인들에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창수(30)씨는 지난달 29일부터 대구 동구 한 ‘장애인 자립주택’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전날 밤 늦게 이 집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48)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였다. 이 활동가는 A씨의 접촉자가 되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A씨를 돌볼 사람이 없어 ‘타가격리’를 자처했다. 지역에서 속출하는 확진환자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자 A씨가 입원 대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립주택에서 같이 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 B(53)씨는 급히 인근 다른 장애인 자립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신체적인 활동에 큰 무리는 없다지만 본인의 욕구를 제어하기 힘든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혼자 남아 언제일지 모를 입원을 기다리기에는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이 활동가는 “자립주택 거주자 가운데 실제로 확진자가 나왔고, 병상이 없다고 하니 크게 당황했다”며 “탈시설 장애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이들의 식사를 챙기고 입던 옷을 소독하고 방역을 하는 등의 활동을 누가 해 주겠나 싶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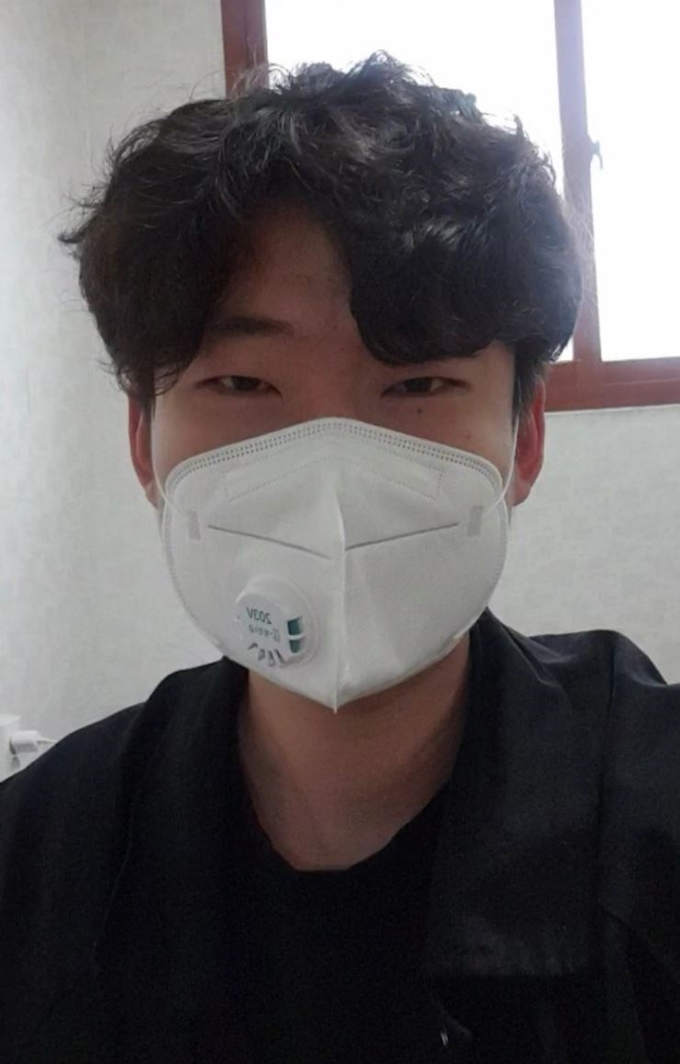
이 활동가는 곧장 2주를 버틸 수 있는 짐을 쌌다.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확진자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몸을 감싸는 방호복을 입고 생활해야 하는 것부터 식사와 청소는 물론 A씨의 건강상태도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 5시 방호복을 입고 자립주택에 제발로 들어갔다. 다행히 A씨와 함께 지낸 지 12시간만에 A씨는 경북 상주시 적십자병원에 입원이 결정됐다. 센터 측의 끊임없는 요구 덕분이었다. 3일째 홀로 자신의 집도 아닌 자립주택에서 지내고 있는 그는 “A씨가 잘 치료돼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소속 정지원(32) 활동가도 인근 장애인 자립주택에서 ‘타가격리’를 자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혼자 남은 발달장애인 B씨를 돌보기 위해서다. 정 활동가는 지난달 26일 A씨의 체온을 측정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대상이 됐고, 자택 대신 홀로 남은 B씨를 지원하며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다. 정 활동가는 B씨의 식사와 위생을 챙기고 보건소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식사는 주로 센터에서 지원받은 컵밥, 라면처럼 간편식이다. B씨가 식사를 마치면 모두 치운 뒤 본인도 식사를 한다고 했다. 정 활동가는 “건강하지 못한 식단이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욱 큰 걱정은 입원과 자가격리에 놓인 장애인들의 상태다. 그는 “살던 곳에서 갑작스레 이동하고 같이 살던 동료도 보이지 않자 B씨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왜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는지도 몰라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연고자인 A씨도 혼자 병원에 입원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대구에서 돌봐줄 이 없는 장애인 13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의 생활을 지원할 인력과 관련 물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자가격리 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원할 생활지원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