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본다, 고전]‘척’과 ‘체’ 없이도 마음 울리는 명언들 가득
※ 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인정하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격주 금요일 ‘한국일보’에 글을 씁니다
<23>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고전’을 읽는 묘미는 그 안에서 훌륭함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의 생각을 엿보고 시차를 뛰어넘어 공감하는 데 있다. 약 500년 전에 태어난 몽테뉴(1533~1592)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수상록’이란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적은 글’을 뜻한다. 몽테뉴는 이 책에 역사, 문화, 윤리, 성(性) 같은 큰 주제부터 인간의 영광과 명성, 자만심, 욕망, 독서, 대화, 결혼과 사랑, 질병, 죽음, 취미, 여행, 세간살이까지, 삶을 이루는 거의 모든 요소를 톺아보며 자기 생각을 담아냈다. 순서에 상관없이 끌리는 주제를 골라, 하루에 한 챕터씩 읽기에 좋다.
“나는 아무 장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놓는다”고 쓴 몽테뉴에겐 지식을 뽐내거나 가르치려는 태도가 없다. 그는 16세기 후반 ‘에세(essai)’라는 문학 형식을 만들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수필 형식을 최초로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몽테뉴다.
“여기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 그것으로 내가 사물들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내놓는 것이다. (중략) 그러니 내가 내놓는 재료를 보지 말고 내가 내놓는 방식에 유의할 일이다.”(136쪽)
그의 재능은 솔직함과 거리낌 없는 태도에 있다. 자신을 높이 두지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으며, ‘척’과 ‘체’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책을 읽다 여러 번 박장대소한 것도 소탈한 그의 성정 때문이다. 책 곳곳에 ‘명언’이라 할 수 있는 문장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말은 박제된 아포리즘이 아니다. 통통 튀는 문장, 여전히 유효하며 살아있는 문장이다. 그가 고전에서 찾아 인용해놓은 문장을 보는 즐거움 역시 크다.
“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출 줄도, 즐겁게 해줄 줄도, 아첨할 줄도 모른다. (중략) 내게는 진심으로 말하는 재간밖에 없다.”
“앉아있으면 생각들이 잠든다. 다리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다.”(143쪽)
“큰 재산은 큰 노예 생활이다.(세네카)” (144쪽)
“나는 젊어서는 남에게 자랑하려고 공부했다. 그 뒤에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다. 지금은 재미로 공부한다. 무슨 소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145쪽)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는 못 견디면서도 그것을 멸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장에서 보는 일이 일어난다. 밖에 있는 새들은 거기 못 들어가서 애를 태우고, 안에 있는 새들은 똑같은 정도로 밖에 나가려고 애쓴다.” (164쪽)
“쾌락에 대한 욕망은 추구해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된다. 그 욕망은 그냥 받아들인다. 그리고 기꺼이 자연의 경향을 따르련다.” (2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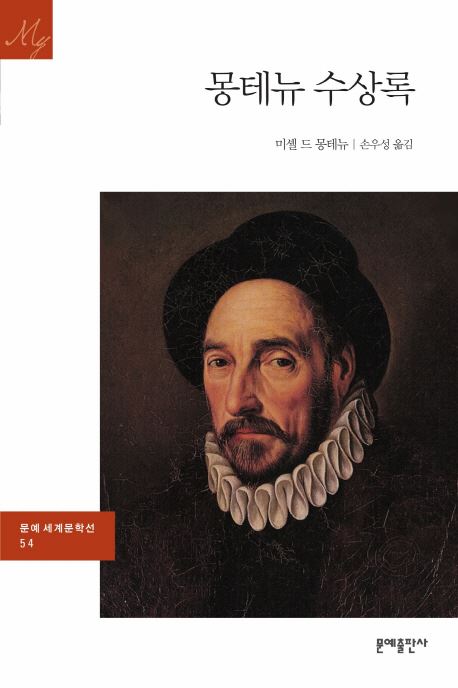
몽테뉴 수상록
미셸 드 몽테뉴 지음ㆍ손우성 옮김
문예출판사 발행ㆍ270쪽ㆍ8,000원
‘수상록’은 그가 7년에 거쳐 증간하며, 두꺼운 양으로 써낸 책이다. “나는 내 수상록이 어느 부인들의 객실에 가보아도 서가에 장식으로만 꽂혀 있는 것이 속상하다”고 한 몽테뉴. 그때나 지금이나, 저자가 자기 책이 안 읽히는 것에 마음 상해하는 건 비슷한가 보다.
혹시 당신의 서가에도 ‘수상록’이 장식으로 꽂혀있다면? 아무 곳이나 펼쳐 읽어보라. 틀림없이 빠져들 것이다. 간혹 읽다가 동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있다!), 그가 옛날 사람, 남자, 귀족이었단 사실을 감안해서 읽길 바란다. “나와 같은 방자한 성미로는 모든 구속이나 의무 같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몽테뉴도 그 시대엔 첨단에 서있었고, 책이 300년 간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다행히 500년을 살아남은 이 책을 “구두쇠가 보배를 즐기듯 책을 즐긴다”는 몽테뉴의 말을 따라, 즐겨보시라.
박연준 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