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과 ‘다문화’라는 두 단어를 들여다보자. 국가 단위를 넘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읽히는 뉘앙스는 다르다. ‘글로벌’은 주로 ‘경쟁력 있는 리더’와 연결되고, ‘다문화’는 ‘지원이 필요한 층’ 등으로 연결된다. 다문화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며, 존중해야 할 다양성이다. 다문화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가야할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자 한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을 한다. 아이들은 교과서에 나온 시를 지역 방언으로 다시 써보고, 해당 반의 시리아 난민 학생은 자신의 모국어로 시를 다시 써본다. 그렇게 하나의 시를 다른 언어로 읽어보며 서로의 다양성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다문화를 그저 ‘다름’으로 인정하는 아이들의 명쾌함처럼, 다문화 구성원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에서 벗어나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자본과 상품, 사람을 이동시킨다. 자본의 이동과 상품의 이동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여전히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동에 대한 규제는 이주라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낸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교육을 위해 잠깐의 이동이 아닌 이주를 택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주에 대한 규제의 벽도 동시에 높아진다. 결혼이민은 그렇게 탄생한 기형적인 사회현상이다. 결혼을 위해 이민을 하면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반면, 이민을 위해 하는 결혼은 결혼이민이라고 한다.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결혼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만큼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갈등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결혼 이민자층이 급격히 늘던 시절의 한국은 외국인 자체가 낯선 존재였다. 혈연을 매개로 하지 않는 귀화 국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모두가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년 전 5만8,000명에서 무려 205만명으로 늘었고, 다문화 가족의 출생아는 23만8,000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다. 대한민국 인구의 4%가 외국인이며 출생아의 5.5%가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다행히 뜻을 모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호응으로 법과 제도를 마련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촘촘하게 세웠다.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인권보호, 자립을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썼다. 그 결과, 지원을 받던 상당수의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에서 의료코디네이터, 국제회의 통역사, 마케팅 전문가, 통번역가 등으로 활약 중이다.
이제 국민의 인식도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 추락 사망사건과 최근 발생한 베트남 여성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다. 정부는 지난 5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대책’을, 지난 11월 22일에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촘촘히 발굴·지원하는 내용과,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주여성들의 체류 안정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폭력’은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다른 것끼리 융화해야 혁신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포용 사회를 디딤돌 삼는다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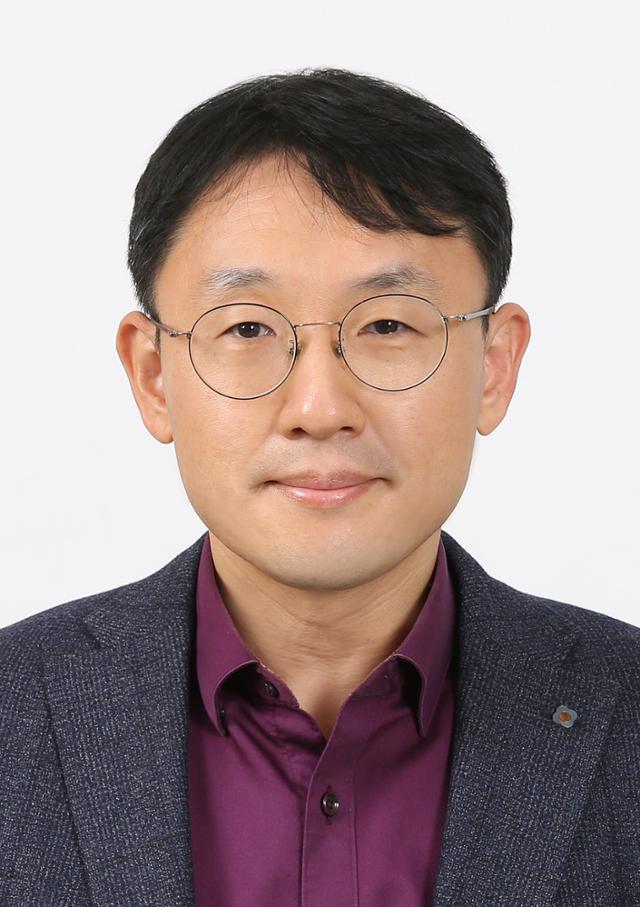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