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문공동체의 위기] 대학 구성원 릴레이 기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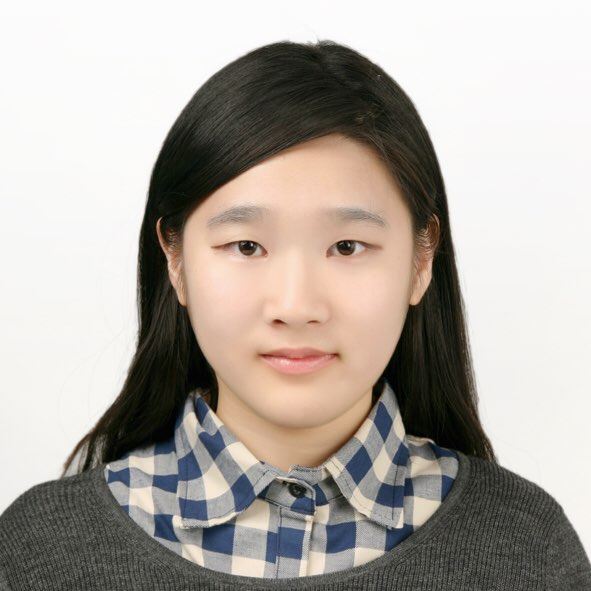
얼마 전 인문·사회계열 학회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학술지 생산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관계자들 중 다수는 이미 학술 활동의 ‘파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학업을 지속해나가기 어려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연구도, 교육도 그 수행 주체들의 삶이 지속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임 교수가 되기까지 장기간의 열악한 처우를 버틸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만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과연 연구자의 수가 줄어들면 모든 연구자가 전임 교수로 임용될 수 있을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학들은 여태껏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준수하기는커녕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심히 벌여 교원들을 통제해 왔다. 국내 대학원 규모가 축소되면,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 박사’ 의존도만 증가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만이 연구자로 남는다면, 그들이 생산하는 전문 지식이 '경제적 약자의 삶'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연구자의 객관적 중립성은 일종의 ‘신화’다. 연구 성과물은 생산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어느 정도는 편향될 수 밖에 없다. 부자만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그들만이 지식 생산을 전담할 때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경제적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든 연구에 정진할 수 있을 때, 훨씬 풍부한 담론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임 교수들이 경제적 편익을 대부분 독식하고, 그 외의 연구자들은 매우 적은 수입만을 가져가는 현재 학계의 분배 방식은, 학문이 이른바 '대가(大家)'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나 몇몇 대가, 몇몇 석학, 몇몇 천재가 학문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다. 이미 현대 학문은 위대한 소수의 ‘업적’에 의해 지탱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크고 작은 학계의 성과들이 서로 보태지며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일종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설사 여전히 학계를 선도하는 어떤 '위대한' 업적이 있더라도, 그 업적은 단독으로 위대해질 수 없고, 언제나 다른 연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위상이 확립된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이란 언제나 공동의 산물이다. 학문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교육 역시 협업에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비정규직 연구자의 성과물이 전임 교수의 것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학문의 발전과 지속은, 일부가 아닌 전체 연구자의 삶이 개선되어야 가능하다. 이제는 지식 생산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어, 어떻게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공에 기여할 지식과 그 생산 주체의 재생산을 지속할지, 답을 내놓을 때다.
한보성 인문학협동조합 연구복지위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