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인정하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격주 금요일 <한국일보>에 글을 씁니다
<16>조지 오웰 ‘나는 왜 쓰는가’

똑똑한 남성이 세상을 위해 투쟁할 때 그를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인가. 대체로 사상, 이즘, 대의명분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생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성공하면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영웅으로 추앙 받는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영웅이 얼마나 많은가. 약자 편을 들지만 강자의 입장이며, 혁명을 원한다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평등을 주창하나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들!
조지 오웰(1903~1950)은 약자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행동한 영국 작가다. 이튼스쿨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고 식민지 인도에서 5년 간 경찰 노릇을 하며, 제국주의의 끔찍함과 식민지인들의 고통에 죄의식을 가졌다. 공산당에 가입하고,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자들의 삶을 취재하기 위해 오랜 시간 몸소 부랑자들과 생활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는 늙은 여성 노동자들(아무도 안 보는!)의 “눈에 안 띄는 경향”에도 주목한다.
“몇 주 동안 매일 언제나 같은 시간에 노년의 여성들이 장작을 지고서 줄지어 집 앞을 절뚝절뚝 지나갔건만, 그리고 그 모습이 내 눈에 분명히 비치었건만, 나는 사실 그들을 봤다고 할 수가 없다. 내가 본 건 장작이 지나가는 행렬이었다. (중략)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반으로 접혀버린, 뼈와 가죽만 남다시피 오그라든 육신들 말이다.”(74쪽)
오웰은 사상이나 언어에만 매몰된 작가가 아니다. 전체주의의 끔찍함, 진정한 혁명을 두려워하는 가짜 사회주의자들, 이기심에 빠진 민족주의를 비판했다.
“1936년부터 내가 쓴 심각한 작품은 어느 한 줄이든 직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맞서고’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이다. 우리 시대 같은 때에 그런 주제를 피해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보기에 난센스다. (중략)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297쪽)
세태 비판을 담은 칼럼에서 그의 문장은 더없이 빛나지만 그가 ‘동물농장’이나 ‘1984’ 같은 명작을 쓴 소설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다른 방식으로 글을 썼을지 모른다던 그는 이런 시를 남겼다.
“200년 전이었다면, 나/ 행복한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지./ 영원한 심판을 설교하고/ 제 호두나무 자라는 모습을 즐기는.// 그러나, 아, 사악한 시절에 태어나/ 그 좋은 안식처를 놓쳐버렸네.(후략)”(295쪽)
이 책 한 권에는 20세기를 가로지르는 역사문제, 작가의 정체성,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고투하는 한 인간의 정신이 담겨있다. 1931년에서 1948년까지 발표한 산문이 시간 순으로 실려 있는데, 시대 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작가의 논지를 볼 수 있다. 순서에서 벗어나 ‘코끼리를 쏘다’, ‘서점의 추억’, ‘두꺼비 단상’,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죽는가’ 등 흥미로운 소제목을 따라 읽어도 좋다.
오웰은 ‘완벽한 인간됨’을 추구하던 자가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명분과 자기 신의를 앞세워 가족에게 상처를 준 간디의 한계를 꼬집으며, 이런 글도 남겼다.
“인간됨의 본질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신의를 위해 ‘흔쾌히’ 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정다운 육체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금욕주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엔 생에 패배하여 부서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이는 특정한 타인에게 사랑을 쏟자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대가다).”(455쪽)
대의보다 사랑, 승리보다 패배를 좇는 ‘똑똑한 남성’이 어디 흔한가? 촌철살인을 무기로 가진 그는 사실 ‘너무’ 따뜻한 칼이었다. 좋은 산문은 유리창과 같다고 한 오웰.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창을 두고, 그와 마주앉은 기분이 든다. 투명하고 따뜻한.
박연준 시인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 지음ㆍ이한중 옮김
한겨레출판사 발행ㆍ478쪽ㆍ1만8,000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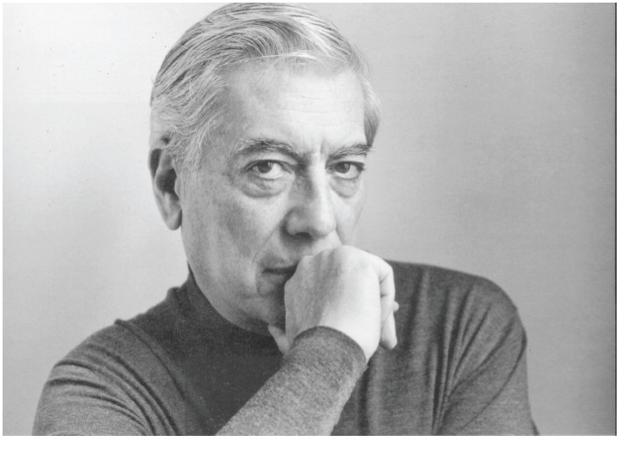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