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무렵이 되면, 후보자들의 사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지곤 합니다. 밥상에 오를 화제가 풍부해지지만, 가여운 마음도 듭니다.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그 누구로부터도 부끄러운 개인사 한두 개쯤 찾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위직에 오를 사람들이라면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 듯합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사회지도층이라는 말은 좀 모호합니다. 요즘 세상에 사회를 지도한다는 말부터 어색하고, 이들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예컨대 제 주변 교수들 가운데 자신이 사회를 지도한다는 망상을 가진 이는 없습니다. 한 번 사고를 내면 사회지도층이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학력이 높거나 전문직에 있는 이들, 혹은 부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기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수, 의사, 사업가와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윤리적일 까닭은 없습니다. 특정분야의 공부를 오래했더니 도덕군자가 되었다거나 큰돈을 벌었더니 갑자기 인품이 훌륭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이들이 대체로 자기중심적이라는 연구는 더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그리고 결국 “모두가 다 도둑놈”이라는 자괴감과 허무주의로 이어지는 반복적 경험은 자기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강박적인 윤리기준을 갖기보다, 직업윤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세의 대학에서부터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직업적인 윤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은 많은 직업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대표적입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신에게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사는 길에 침을 좀 뱉더라도 좋은 의사입니다. 더러 친구 돈을 좀 떼먹더라도, 응급환자에게 기꺼이 달려가는 소방관들은 좋은 소방관입니다. 좋은 직업인들이 많은 사회는 대체로 건강합니다.
학자들에게는 의사들과 같은 명문화된 공통 윤리규범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에 못이 박이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 논증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제아무리 대가의 의견이라고 해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보다, 권력보다 진실이 맨 앞에 놓여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입니다. 저는 학문의 가장 큰 매력을 여기에서 느낍니다. 수십년 후배와 논박을 벌이다가 자신의 학설을 교정하는 대가. 함께 연구한 학생이 뛰어난 연구결과를 도출했을 때 저자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뒤로 넣는 교수. 그들이 때로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한다고 해도 이런 이들은 좋은 학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크게 유명해진 두 분의 전ㆍ현직 교수에 대해 생각합니다. 큰 논란의 중심이 된, 어떤 베스트셀러를 쓴 전직교수는 그 책에 자신의 연구와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독자로서는 어디까지가 연구이고 어디까지가 사적 진술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유명연구자로서의 권위를 그저 개인적 상념을 옹호하는 데 쓰는 것은 권위에 의한 논증이라는, 학자라면 마땅히 피해야 할 오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고위공직 후보가 된 또 다른 교수의 경우, 자신의 고교생 딸이 제1저자로 논문을 썼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연구기여도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한 번쯤 꼼꼼히 살펴 보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1저자의 자리는 실험을 도운 사람이 아니라 연구를 주도한 이의 몫이라는 것이 학자들이 공유하는 윤리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세상은 뛰어난 성인군자들이 사회를 지도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박한 직업윤리를 귀하게 여기는 이들 덕에 지탱됩니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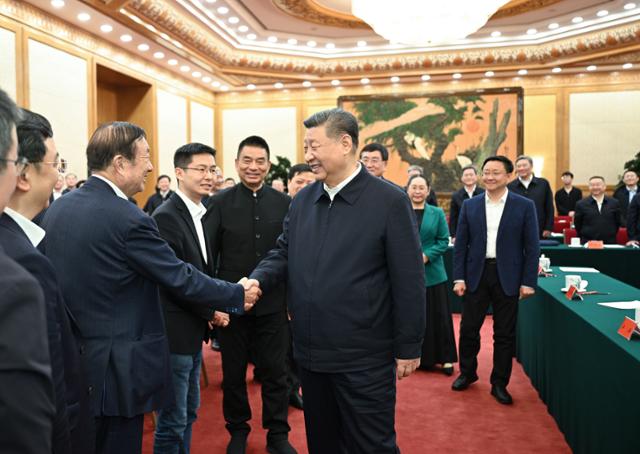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