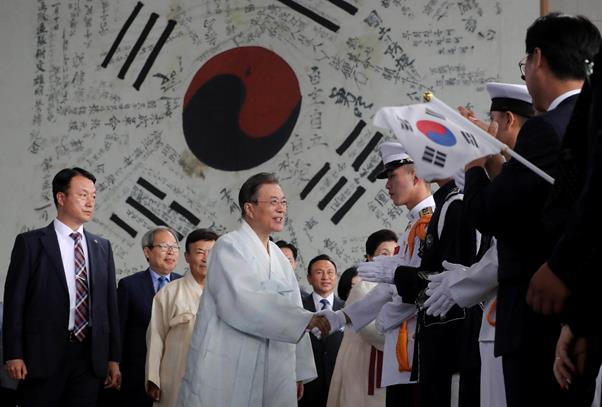
일본에서 일하다 보니 ‘일본통’ 소리를 종종 듣는다. 내가 일본 장학금을 받아 일본에서 박사를 한 줄 아는 사람도 있다. 사실 난 일본 산 지 2년도 안됐고, 전에 일본에 산 적도 없다. 강의도 100% 영어로 하고, 학생도 상당수가 미국, 유럽인이다. 사실 박사학위는 미국에서 받았고, 미국의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미국인들이 주는 장학금, 봉급도 받았다. 나는 친미파인가?
외교부 시절 첫 보직이 아시아태평양국 중국과였다. 미국, 일본 담당 부서에 근무해 본 적이 없다. 북핵외교기획단 근무 때도 주로 중국 업무를 했고, 출장도 중국을 제일 많이 다녔다. 석사는 중국 정치로 했다. 첫 해외공관도 주중국대사관이었다. 3년간 중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중국의 언론인, 지식인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 나를 아는 중국 외교관들은 나를 중국의 ‘펑여우(朋友: 친구)’라 부르기도 했다. 나는 친중파인가?
러시아에도 2년반 근무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기초 러시아어는 할 줄 알게 되었다. 모스크바는 물론, 러시아 극동의 소도시들까지 돌아다녔다. ‘보르쉬’라는 러시아식 수프를 좋아하고, 블라디미르 뷔소츠키가 부르는 ‘야생마’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즐겨 듣는다. 러시아 국세청이나 검찰청과 치열한 협상을 벌여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도 했다. 나는 러시아통인가?
친미, 친일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구한말 조선이 떠오른다. 당시 지도자들은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누구 편들 것인지에만 집착했다.
중심을 바로 세우려면 우선 우리의 독립 자존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을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수단들을 챙겨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종합적 판단하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이 가능해진다. 중심을 바로 세우면 친미, 친일, 친중, 친러 모두 큰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위정자들은 독자적 정책결정과정 수립에 실패했다. 청나라를 임금으로 섬기는 소중화 의식에 사로 잡혀 자신들이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논어, 맹자가 자신들의 도덕적 지침이며 자신들의 왕의 정치적 정당성이 그들이 ‘천자’라고 부르는 중국의 왕에게서 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스스로 변화하여 국력을 키울 생각은 없이 걸핏하면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때 청군을 불러 들여 진압했다. 청이 일본에 패하자 고종은 주한 러시아공사관으로 망명하는 치욕적 선택을 했다. 친러파 시대가 열렸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자 이제는 친일파 시대가 열렸다.
그 와중에도 고종은 미국을 믿었다. 조미수호조약에 따라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개입하여 거중조정해 줄 거라 믿었다. 영국의 거문도 침략, 청일ㆍ러일전쟁 때도 고종은 미국의 거중조정을 요청했다.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나서야 거중조정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조선은 국력 증진을 위한 스스로의 종합적 개혁구상에 따라 동맹 대상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고정관념과 상황에 밀려 강대국 사이를 표류했을 뿐이다. 수십 년 표류 끝에 조선왕조는 전쟁 한 번 못 해 보고 멸망했다.
우리는 미중 간 경제력이 크로스하는 세계정치의 구조변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의 목표와 역량에 대한 냉정한 종합적 판단이 급선무이다. 누구와 손잡을 것인지, 싸울 것인지는 그 다음이다. 국력증진의 방략에는 눈을 감은 채 누구 편들 것인지에만 집착하면 조선왕조처럼 된다. 친미, 친일, 친중, 친러 모두 필요에 따라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반일’이 국가적 구호가 되어 가는 지금, 나는 묻는다. 냉정한 종합 판단에 근거한 우리만의 계획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인가?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ㆍ정치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