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의 트윈리버스 학군은 교육자금파트너(EEP)라는 회사의 제안에 솔깃해진다. 연간 50만달러를 학교에 제공하는 대신 교내 기업 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게 EEP의 거래 조건. 자금 사정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학군 이사회는 이를 냉큼 받아들였다. 교내에선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광고가 범람했고, 광고주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광고 수용성이 더 높다며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학생들에 대한 접근권 판매는 이러한 형태로 미국 곳곳에 퍼졌다. 플로리다의 어떤 학군 이사회는 맥도날드 로고를 성적표에 넣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성적이 좋으면 해피밀을 공짜로 먹을 자격까지 주면서 말이다.
과연 이들만의 이야기일까. 팀 우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이의 원인을 분석한 ‘주목하지 않을 권리’를 냈다.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아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온 ‘주의력 사업’의 면면을 파헤쳤다. 과거 정치 선전, 종교 포교 메커니즘부터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미국의 사례 중심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직후 광고는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았다.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광고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1920년 광고 업체 매출은 2배로 늘었고, 1930년까지는 10배까지 증가했다. 광고 산업은 선진국의 경제를 재편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평균 가정의 연간 내구재 지출액이 1900년 무렵 79달러에서 1920년대 279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광고는 매체 발전을 디딤돌 삼아 시대를 거듭하며 주의력 빼앗기에 몰두했다. 보고 싶은 TV 드라마 한 편을 보려면 수십 개의 광고를 참아야 하고, 인터넷 창을 열었다가 클릭을 유도하는 미끼 링크에 걸려 한참 고생을 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한 과학자가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시대 최고 지성들은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을 정도로 우리는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광고 산업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많은 주의력을 요구하면서 대가를 너무 적게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대중에게도 깊이 각인되고 있다. 많은 세대가 광고를 ‘건강한 생활을 위해 피해야 하는 또 하나의 독소’로 여기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넷플릭스는 회원제를 채택해 광고 없는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고, 애플은 광고 차단 프로그램으로 배터리 소모량을 줄인다. 이 같은 방침이 그 변화를 방증한다.
저자는 “각자의 유용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준보다 너무 많은 광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서문에선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 온라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경우엔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세상을 직시하고 이해하며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온갖 눈속임으로부터 자신의 의식을 지키는, ‘인간 되찾기’ 프로젝트 말이다.” 저자가 남기는 메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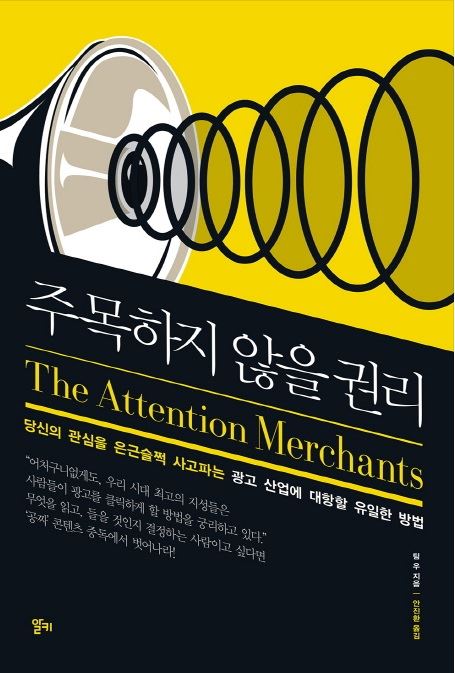
주목하지 않을 권리
팀 우 지음ㆍ안진환 옮김
알키 발행ㆍ576쪽ㆍ2만5,000원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