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인정하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격주 금요일 <한국일보>에 글을 씁니다.
<8>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

얼마 전 ‘아무튼, 비건’이란 책을 읽고 채식주의자(페스코)가 되기로 했다. 육고기를 딱 끊었다. 어렵지 않았다. 신념이 욕망을 이기는 걸까? 그보단 ‘책의 힘’이다. 책은 사람을 바꾼다. 새로 생긴 기특한 마음을 견고히 하고자, 전에 읽다 만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을 다시 꺼냈다. 그땐 왜 감흥이 없었을까? 소식(小食)하라는 말에 귀를 닫고 싶었을 게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실천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다.
헬렌 니어링(1904~1995)은 채식을 실천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스콧 니어링과 시골로 들어가 글을 쓰고, 자연주의자로 살았다. 스콧은 100세까지, 헬렌은 91세에 차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장수했다.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은 ‘소박한 사람들을 위한 소박한 음식’에 대한 “반(反)요리책”이다.
작가는 간단한 요리가 좋다, 재료 그대로를 먹는 건 더 좋다고 말한다. “나는 요리하는 여성이 아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다른 여성들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나는 여성이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화덕 앞에 머물며 음식을 만들고 가사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략) 나는 요리보다는 좋은 책 읽기(혹은 쓰기), 좋은 음악 연주, 벽 세우기, 정원 가꾸기, 수영, 스케이트, 산책 등 활동적이고 지성적이거나 정신을 고양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41쪽) 전적으로 동감한다! 누군가는 요리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지만, 모든 사람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먹는 일’에 관해 쓴 옛 사람들의 말을 엿보는 일도 이 책을 보는 재미다. 헬렌이 도서관에서 희귀본을 찾아, 인용할 문장들을 모았다고 한다.

“자주 먹는 사람은 괴로운 삶을 산다.” (앤드루 부르드 ‘건강 식이요법’(1542))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식사할 의도로 하지 말고, 금식을 깨는(Break Fast) 게 아닌 듯 먹으라.” (딕 후멜베르기우스 ‘식탁과 부엌과 저장실의 이야기’(1836))
“더운 날씨에 식사를 준비하고, 나중에 설거지하는 일이 무덤덤한 필자가 엄숙한 산문을 쓰는 것이라면, 디저트를 만드는 일은 시에 비유될 것이다.” (M.E.W. 셔우드 ‘접대의 기술’(1892))
책 2부에는 아침식사, 수프, 빵, 디저트 등 식재료에 대한 생각과 헬렌이 고안한 레시피를 담았다. 계절 수프, 대파 수프, 감자 수프, 양배추 진한 수프… 다양한 샐러드들, 하와이식 당근 요리, 비트 조림, 양배추 냄비 요리, 멕시칸 라이스, 과일로 맛을 낸 각종 디저트들까지 초간단 조리법을 제안한다. 먹어 본 손님들이 레시피를 알려 달라고 했다니, 맛도 좋은 모양이다.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 숙고한 작가는 헬렌 니어링뿐이 아니다. 카프카는 수족관 앞에서 물고기들을 바라보다 “다시는 너희들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뒤, 비건으로 살았다고 한다. 문명을 등지고 숲속에 들어가 산책과 글쓰기를 한 소로는 이렇게 썼다. “나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게 된 고기의 단점 때문이 아니라, 내 상상력에 고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고기를 혐오하는 것은 경험의 효과가 아니라 본능인 것이다. 고매하고 시적인 재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열심인 사람이라면 특히 고기를 멀리할 것임을 나는 믿는다.”(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1854))
나는 이들을 따라 채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인간의 정신과 상상력, 나아가 사는 형식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미디어에 ‘먹방’이 차고 넘친다. 먹는 것에 미친 광신도들 같다. 누군가 추천한 식당에 사람이 몰린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행위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다만 이 무분별한 쏠림 현상, 획일화되는 욕망, 식탐을 조장하는 ‘지금의 음식 문화’를 따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음식은 몸의 활력을 만드는 연료이고, 영혼을 활짝 펼치는 촉매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죽음의 질을 결정한다(삶의 질이 아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은 어떻게 살면 좋을지 고민이 될 때, 부엌에 두고 수시로 꺼내 보면 좋을 책이다. 내 몸의 나침반이 되어 줄 책, 탐욕으로 영혼이 누추해질 때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아껴 보는 요리책이 한 권 있다는 것. 근사한 인생을 살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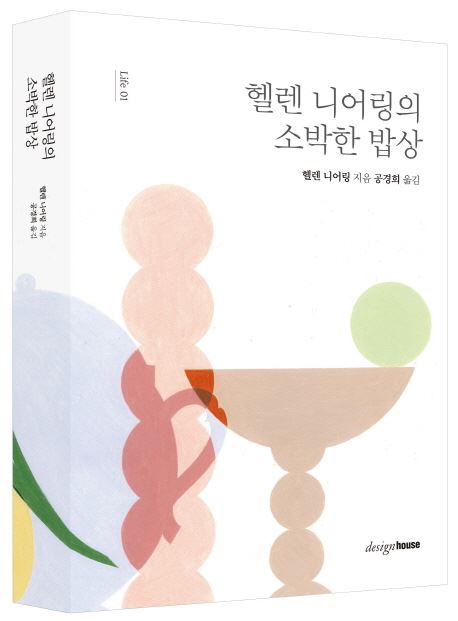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
헬렌 니어링 지음ㆍ공경희 옮김
디자인하우스 발행ㆍ320쪽ㆍ1만 4,800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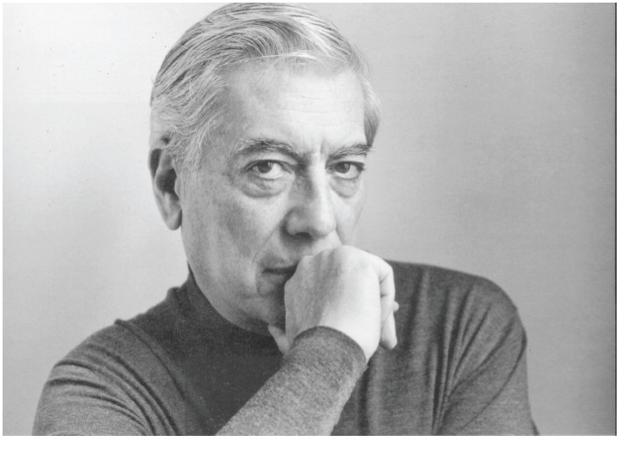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