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석 경상대병원장 "상급병원 쏠림현상 심각… 지역병원 수년 내 고사”
경상대병원은 15년간 운영해 온 가정의학과를 올해 1월 1일부로 없앴다. 병원 내부에서 환자가 감소해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중증질환 치료와 연구ㆍ교육이라는 상급병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폐과를 결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 가정의학과는 진료의뢰서 없이도 외래진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상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진료의뢰서 없이 찾아오는 환자들의 타과 전원 창구로 변질돼 있었다. 경남 서부지역의 유일한 상급병원이어서 멀리서 의뢰서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던 까닭이다. 많게는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방문해 거의 전원이 다른 과 진료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신희석 경상대병원장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상생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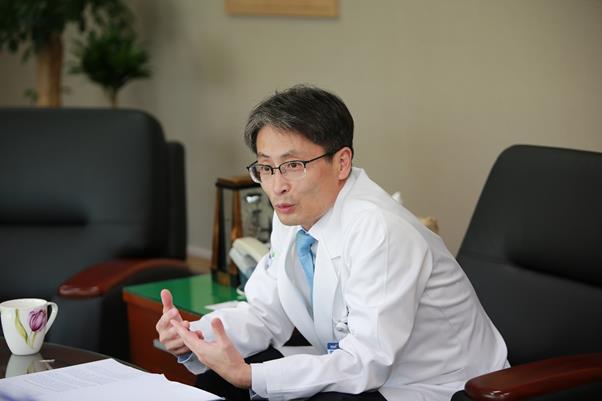
폐과 이후 경상대병원을 찾는 초진 환자는 실제로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전체 환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올해 1~4월 외래환자는 18만5,2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한 수준이다.
어찌된 일일까.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환자 수가 줄지 않은 것이다.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2ㆍ3인 입원실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이 이왕이면 큰 병원을 찾게 됐다. 신 원장은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은 정보교류가 느려서 서울 대형병원만큼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수도권 상급병원도 환자 쏠림 현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들의 잔병치레가 많은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와 안과는 벌써 외래환자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의료현장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동네 병원들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상급병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크다. 신 원장은 “지역병원장들과 이야기해 볼 때마다 이대로 가면 지역병원은 수년 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라면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중증환자들이 퇴원 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병원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신 원장은 “욕 먹을 각오로 (정부가) 상급병원을 찾는 경증환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국민들에게 건강수준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정부도 의료전달체계를 회복하고 상급병원은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있도록 수가를 조정해 놓았다. 신 원장은 “경증 환자라고 해서 치료에 인력이나 자원이 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수익성은 낮다”라면서 “세간의 인식과 달리, 불필요한 검사를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식이 아니라면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를 치료해야 건강보험 수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병원 입장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상급병원’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정부가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할 때의 부담을 늘려 환자들의 지역 병원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상대병원의 경우 환자를 동네병원으로 돌려보낸 회송사업 건수가 지난해 1,500여건에 그쳤는데 이를 확대하고 싶어도 참여를 원하는 중소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소병원들 스스로도 부담스러운 환자를 받았다가 사후관리 중 원내감염 등 사고가 날 까봐 우려하는 탓이다. 특정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에 걸려 경상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절반은 치료가 끝났지만 전원할 중소병원을 찾지 못해 입원실에 남아있다. 신 원장은 “정부가 회송사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살리려 한다면 1, 2차병원의 질부터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 조정 등 강제적 수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