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완서 작가의 소설은 냉정한 시선으로 사회의 허위를 들춘다. “어디 정말 효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 봐요. 효자가 있는 게 아니라 효부를 아내로 둔 남자가 있을 뿐이에요. 효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있는 건 여자지 남자가 아니에요.” 장편소설 ‘살아 있는 날의 시작’(1980) 속 문장엔 뾰족한 진실이 있다. ‘시부모 잘 섬기는 며느리’를 뜻하는 효부(孝婦)는 가부장제를 떠받치는 ‘그림자 노동력’이었다. 조선은 며느리의 효행을 독려했다. ‘오륜행실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지방 행정대장인 ‘읍지’ 등에 효행 목록이 기록됐고, 효부비ㆍ효열비를 세워 효부를 기렸다.
□ 효부는 여전히 국가의 이름으로 칭송받는다. 인터넷 포털에서 ‘효부상’을 검색하면 올해 어버이날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협회 등이 준 상을 받은 며느리들 기사가 줄줄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성별 구분 없이 효행자들에게 훈ㆍ포장과 표창을 줬는데, 대개 며느리들에게 돌아갔다. 수상자 중엔 여성이, 그중에서도 딸보다 며느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만성질환을 앓는 시부모를 수십 년간 극진히 수발한 고령 여성이 대부분이다. ‘제 삶을 돌보지 않은 돌봄 노동’이 효행상 수상 자격인 셈이다.
□ 돌봄 노동은 육체ᆞ감정 노동이 결합된 극한 노동이다. 집안의 돌봄 노동은 오랫동안 가족 위계의 맨 아래에 있는 경제력 없는 여성, 즉 며느리의 몫이었다. 여성은 자식의 의무보다 며느리의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했으므로, 출가외인인 딸은 열외였다. 세상은 서서히 눈을 떴다. ‘양육부터 간병까지, 사회 전체의 돌봄 노동을 여성의 자발적 희생에 맡기는 것은 잘못이다.’ 뒤늦은 사회적 합의로 정부는 돌봄의 공공화에 힘을 쏟고 있다. 결혼 기피 시대엔 어차피 며느리가 충분히 ‘생산’되지도 않는다.
□ 최근 보도된 한국일보의 ‘간병 파산’ 기획과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기획을 보면, 갈 길이 한참 멀다. 국가가 나서고도 간병ᆞ요양 실태가 엉망인 것은 그간 며느리들이 엄청난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픈 타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걸 ‘며느리의 도리’라 규정하고 도리를 잘 수행한 며느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 21세기에 걸맞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봉사상’이나 ‘인류애상’이 낫겠다 싶다.
최문선 문화부 순수문화팀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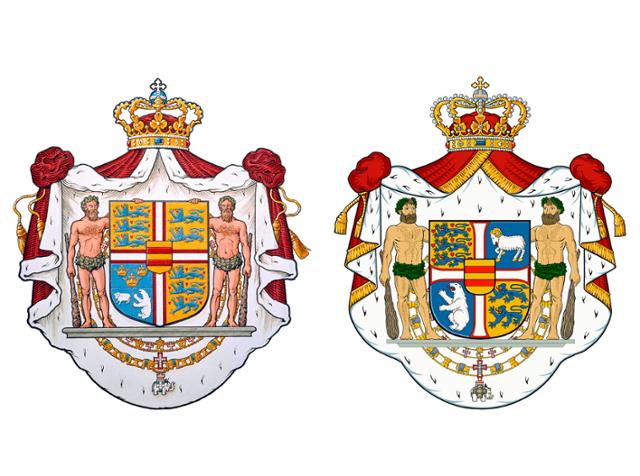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