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평양 옥류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한국 재벌 총수들에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호통을 쳤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손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북한 간부의 거친 언행에 한국 국민들은 당황했다. 남북한 문화 차이의 골은 그렇게 깊었다.
‘북한사람과 거래하는 법’은 20년 간 대북사업을 하면서 ‘냉면 발언’보다 더한 수모를 겪어낸 대북사업가의 분투기다. SBS PD 시절 ‘조용필 평양 공연’을 성사시킨 것을 비롯해 대북 민간 교류 사업을 개척한 오기현씨가 썼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 인정 받는 북한 전문가다. 1998년부터 28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의 대남 사업가 80여명과 100여차례 협상을 벌였다. 책은 대북사업가를 위한 실용 안내서를 표방하지만, 딱딱한 실용서가 아니다. 북한 사람들과 부대낀 세월의 내공이 녹아 든 덕분에, 북한 사회와 북한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 준다.

대북 사업가들이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다.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인데, 통하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정서다. 저자는 북한을 움직이는 건 ‘정’이 아니라 ‘돈’이라고 단언한다. 남북 교류를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내세우는 반면,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한다. 저자에 따르면, 북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북한 체제를 칭송하거나 사적으로 친한 척 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역사ㆍ학술 교류는 ‘가장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교류 분야’로 꼽힌다. 저자는 이의를 제기한다. 남북의 역사 인식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에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누구나 아는 위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 주민들은 ‘3ㆍ1 운동이 김일성 수령님의 올바른 영도력으로 가능했다’고 학습 받는다. ‘한 민족, 한 역사’라는 접근 방식이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 사람들의 이중성은 넘어야 할 큰 고비다. 북한 사회는 명목 상 애국심을 강조하고 공동체주의를 지향하지만, 주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연대의식은 약하다. 각자에게 할당된 일만 하고, 타인과 조직의 일엔 관심이 없다. ‘수령님에게 나만 잘 보이면 된다’는 충성 경쟁의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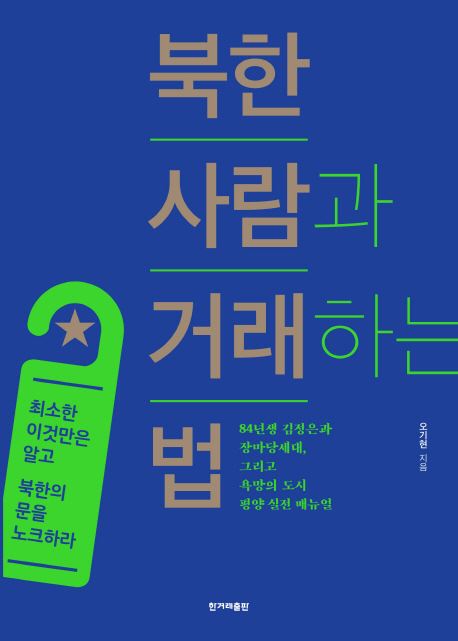
북한 사람과 거래하는 법
오기현 지음
한겨레출판ㆍ248쪽ㆍ1만 5,000원
‘도움을 받아도 절대 고맙다고 하지 않고, 잘못해도 절대 사과 하지 않는, 의리는 없지만 돈은 또 엄청 밝히는 사람들.’ 북한 주민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더 가까운 특징들이다. 실제로 최근 북한에서 자본의 위력은 대단하다. 국가 배급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마당 세대와 신흥자본가인 ‘돈주’들이 자본의 힘을 맹렬하게 전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대북 교류는 ‘잘 살고 싶다’는 북한 사람들의 열망을 건드리고 실현해 주는 데 있지 않을까. 거창한 명분이나 정치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