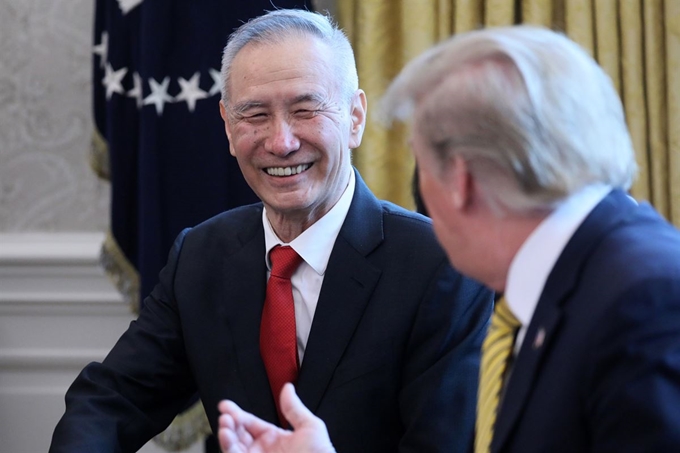
미국이 중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을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 학자들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이들이 미국의 정보를 수집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국은 “옹졸한 경찰국가”라고 비난하며 반발했다.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무역전쟁의 갈등이 난데없이 학계로 튀어 양국 간 앙금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30명에 달하는 중국 학자들의 비자를 취소해 사실상 미국 방문 금지령을 내렸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부터 이들의 스파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방첩활동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주로 과거에 미국에 입국했거나, 체류 기간 FBI 조사를 받았던 기록을 근거로 재발급이 거부된 경우다. 우바이이(吳白乙)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장도 1월 애틀랜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방문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정부기관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의 제품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안보와 직결된 부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경계대상 목록에 중국 기업과 대학 37곳을 새로 올리는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스파이 위협은 억지”라며 격렬히 비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16일 “첨단 과학기술이 아닌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한 적이 없었다”며 “미국의 자신감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옹졸하게 트집을 잡는다는 얘기다. 이어 “미국이 경찰국가라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던 자유와 인권이 이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무역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을 의식한 듯, 비난 수위를 조절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얼마나 옹졸하든 상관없이 중국은 대외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래야 전략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스파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미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계 미국인 여성사업가 신디 양을 지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몰아가자, 중국은 “죄다 스파이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별장에 들어가려다 최근 붙잡힌 중국인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스파이냐”고 반박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