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진보 2020대선 앞두고 갈림길
계급인가, 집단인가 노선의 충돌
새 세대의 새 이념 모색에 주목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군 가운데 1, 2위를 달리는 것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다. 백인 남성들이 선두인 건 미국 정치에서 익숙한 장면인데도, 이번에는 어색하고 낯설다.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 선거는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여성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이끌었다. 더욱이 이 경선은 인종ㆍ성ㆍ세대별로 가장 다양한 선수들이 뛰는 붐비는 운동장이라고 한다. 70대 백인 남성이 다시 나선 건 죄송한 일이다.
사실 바이든은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여러 차례 공개사과를 했다. 1991년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에서 성폭행을 증언한 애니터 힐 교수를 윽박지른 것, 94년 강력범 처벌법을 주도한 것은 큰 실수라고 뉘우쳤다. 전자는 미투 (#MeToo)에 대해, 후자는 흑인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항의하는 ‘흑인들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의 ‘블랙 라이브즈 매터(BLM: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고개를 깊게 숙인 것이다. “백인 남성 문화 (white man’s culture)”가 화가 난다고까지 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캐서린 파커가 “이쯤 되면 태어나서 죄송하다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을 정도다.
‘정체성 정치 (identity politics)’가 미국 정치의 중앙무대에 올랐다. 좁게는 페미니즘이나 성적소수자의 정치활동을 뜻하던 용어에서, 또는 우파가 좌파의 노선을 비하하던 말에서 이제는 주류정치의 규범을 뜻하게 됐다. 미국뿐 아니라 탈이념 시대 이후 세계 민주주의의 방향을 좌우할 흐름 가운데 하나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체성 정치란 변화의 방향으로 인종, 젠더, 민족, 출신지역, 문화 등 집단의 입장을 다른 보편적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용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것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트럼프의 당선에서 중동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글로벌 현안의 열쇠를 푸는 “마스터 개념(master concept)”이라고 주장한다. 30년 전 인류가 이념을 찾아 헤매는 구도의 과정을 끝냈고,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던 후쿠야마다. 이제는 민주주의 체제들이 최대 현안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경제 대신 좁은 차원의 정체성에 몰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제에서 신자유주의와 차별화를 하지 못한 진보세력이 인종과 이민정책 등에 치중했고, 그 전략을 학습한 우파가 민족주의 정치를 정체성 정치로 일반화했다.
정체성이 “방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이던 때가 있었다. 오바마는 흑인 청소년이 살해되고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이 일어났을 때, “내게 아들이 있다면 그처럼 생겼을 것”이라는 우회적인 말로 공감을 표시했다. 힐러리는 여성성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선거운동 중 그는 여성 시민으로부터 “어떻게 해내나요?(How do you manage it?)”라는 질문을 받고 눈물을 쏟았다. 언론은 “처음으로 여성성을 드러냈다” 고 전했다. 우는 것이 여성의 정체성으로 취급되던 때가 불과 10년 전이다.
2020년 대선의 정체성은 공격적이고 확장적이다. 계급이란 소수자들을 잡아두려는 덫(working class trap)이라고 주장한다. 버니 샌더스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난 여성이다, 난 라틴이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가 색맹경제(color-blind economics)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1981년~96년생)는 흔히 미국에서 처음으로 다수가 사회주의에 호의적이 된 세대라고 한다. 사실 이들은 비(非)백인 인구가 절반에 육박하고 전례없이 정체성이 다양해진 인구층이기도 하다. 자기 정체성을 주장할 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만드는데 익숙한 세대다. 이들의 시대에 경제적 계급과 집단 정체성이 상충하기 시작했다. 이 모순의 해결이 세대 선택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유승우 뉴욕주립 코틀랜드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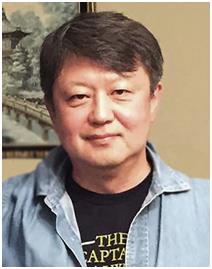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