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에서, 페이스북에서, 그마저도 아니라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스크린도어에서. 시가 아무리 어렵고 낯설다 해도 누구나 인생에서 한번쯤은 시와 마주치게 된다. 시험 공부를 위해 외운 시가 어른이 된 뒤에도 종종 입 안에 맴도는 것이, 시의 치명적이고도 질긴 매력이다.
‘누가 시를 읽는가’는 저마다 하나씩은 있을 시와의 사적인 만남을 한데 엮은 책이다. 미국의 유서 깊은 시 전문지 ‘시(Poetry)’에서 50명의 독자에게 지금 시대에 누가 시를 읽는지, 그들은 언제, 어떻게 시를 만났는지, 또 그 경험은 각자에게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답한 이야기를 모았다.
경험을 털어 놓은 건 시와 직업적 연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다. 록산 게이 같은 유명 작가에서부터 음악가, 만화가 등 예술가도 있지만 시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 것처럼 보이는 산파, 군 장성, 야구선수, 목사, 철공노동자, 정신과 의사, 국회의원, 경제학자도 있다. 그들의 고백에 따르면, 세상에 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철공 노동자로 29년째 일하고 있는 조시 원은 정교하게 짜인 시의 질서에서 트럭 짐칸에 가득 쌓인 상자들과 같은 종류의 매력을 발견한다. 그는 기다란 시를 머릿속에 담는 일을 “까다로운 용접을 마치거나 굽은 계단에 철제 난간을 세웠을 때와 유사한 만족감”이라고 표현한다.
루스벨트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스티븐 T. 질리악은 하이쿠(17음으로 이뤄진 일본의 정형시)에서 “정밀성과 효율성을, 객관성과 효과의 극대화를, 다른 말로 하자면 가치중립적인 과학의 덕목”을 배운다. 그는 “경제학 이론이 지나치게 허구적인 장치에 의존하는 반면, 시는 현실적인 것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시인들의 도움을 받아 경제를 고칠 수 있다고까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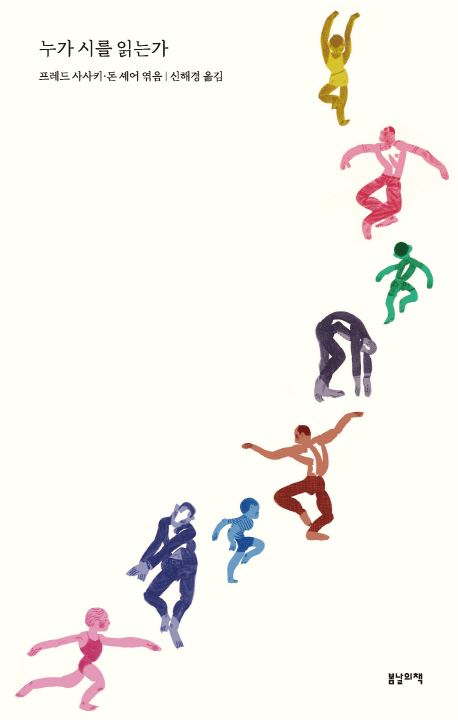
군인에게 시는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총장을 역임한 윌리엄 제임스 레녹스 주니어는 “소통할 수 없는 이는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관생도들이 16주에 걸쳐 시 수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의과대학 신경외과 임상 교수인 리처드 랩포트는 “임상 의학이 과학이 아니라 기술의 문제가 된 시대에, 공동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사랑과 노동이며, 때문에 의사가 되려는 젊은 사람에게는 시인들이 필요하다”면서 역시 시 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들이 대단한 안목과 심미안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는 시를 고른 건 아니다. 파블로 네루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비스바와 쉼보르스카처럼 한국인이 윤동주, 김수영, 기형도의 시에 익숙하듯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시인과 시들이다. 시집 전문서점 서울 혜화동 위트앤시니컬을 운영하는 유희경 시인은 추천사에서 “오십 명의 독자가 적은 ‘시에 끌리는 이유’를 읽으며 사람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읽었다”고 전했다.
시 사랑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한국 독자들의 고백이 책의 한국어판이자 2탄이 될 예정이다. 자신만의 소박한 시 읽기 경험담을 올해 말까지 투고하면 심사를 거쳐 책으로 만들어진다. 문의는 봄날의 책 출판사(springdaysbook@gmail.com)로 하면 된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