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응과 전복
김영진 지음
을유문화사 발행ㆍ340쪽ㆍ1만8,000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젠 어딜 가나 한국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대 한국 영화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해외 영화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그럴 만도 하다. 1990년대까지 세계 영화계에서 한국 영화는 변방 중에 변방 취급을 받았다. 극동의 가난한 작은 국가 한국의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 영화는 더더욱 낯설 만도 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영화는 세계 무대 중심에 다가갔다.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칸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더니 2004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졌다. 영화 수출이 늘었고,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 영화들도 생겨났다. 2000년대는 한국 영화 전성기로 꼽힐 만하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기업의 진출, 정부의 적극적인 영상산업 지원,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범 등 영화계 안팎에서는 여러 요인을 꼽지만, 신진 감독들의 새로운 영화들에서 이유를 찾는 이들도 많다. 영화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영화평론가로 오래 활동해 온 김영진 명지대 영화학과 교수 겸 전주국제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는 2000년대 한국 영화의 방향을 바꾼 영화와 감독들에 주목한다. 이들 영화들이 탄생한 배경, 미학적인 분석, 사회와의 조응, 감독의 작가적 특징 등 입체적으로 접근하며 ‘현대 한국 영화의 어떤 경향’(책의 부제다)을 탐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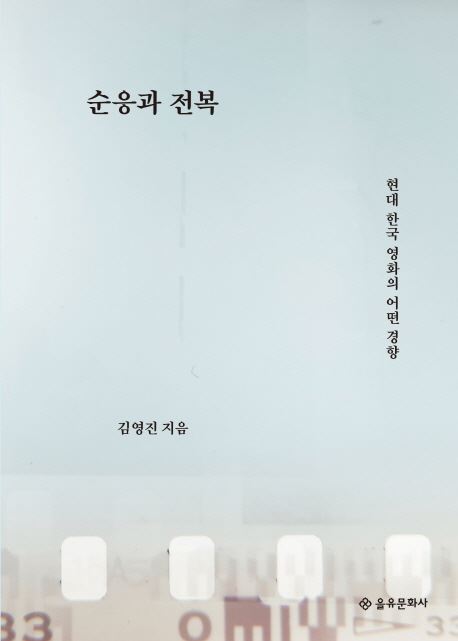
김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감독들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칭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영화는 과거와 단절됐다.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 신진 영화인들의 대거 등장도 이유이겠지만, 김 교수는 신세대 감독들의 영화 세계에 눈길을 준다. 신세대 감독들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라 할 선배 감독들의 영화를 보지 못했다. 대신 할리우드와 유럽 영화 등에 경도됐다. 충무로의 영화적 전통에서 자유로웠던 신세대 감독들은 “어떤 장르 규범의 세련과 혁신으로 제작자와 대중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인가”(17쪽)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박찬욱ㆍ봉준호ㆍ김지운ㆍ허진호 감독 등은 ‘족보’나 ‘계통’ 없는 모험을 감행했는데, 그 힘든 여정이 가능하도록 한 힘은 젊은 감독들의 상상력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그 힘의 정체를 밝히는 게 여전히 필요하다며 책을 통해 정체에 다가가려 한다.
장 사이 부록처럼 끼어든 글들도 흥미롭다. 저자가 유명 영화인들을 만나며 느낀 한국 영화계에 대한 단상이 담겼다. 영화인들과 관련한 에피소드와 더불어 한국 영화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흥행사와 영화 작가의 갈림길에서 충무로를 호령했던 강우석 감독에게선 2000년대까지 한국 영화계에 남아 있었던 감독의 가장(家長) 의식을 발견한다. ‘투캅스’ 시리즈와 ‘실미도’ 등으로 큰 부를 이뤘던 강 감독은 불우한 영화인들에게 지갑 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빚더미에 앉은 한 제작자에게는 주식을 건네며 자식 교육에 쓰라고 했고,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투자자를 못 찾자 영화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돈을 댔다. 주변 영화인들을 건사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