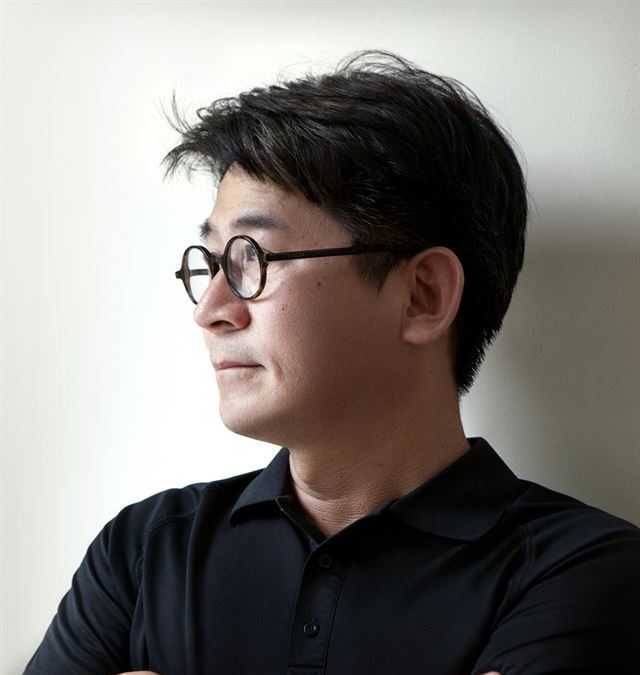
만 스무 살에 만나 스물아홉을 꽉 채우고 갔으니 알고 지낸 세월이 10년 남짓이다. 형도와 함께 한 10년은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라기보다는 긴 여행을 함께 다닌 시간 같다. 형도의 죽음 이후 30년은 형도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여행이었지만, 늘 함께 여행을 다닌 느낌이다. 형도가 내 삶과 존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일 거다.
나는 소모되고, 나이 들고, 닳고, 지치지만, 형도는 영원한 젊음으로 남아있다. 생이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형도가 젊게 기억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남긴 시와 산문들이 당대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갖기 때문에 영원한 젊음의 상징이 됐다. 불안과 절망, 좌절과 희미한 희망. 형도가 포착해 시에 투영한 젊은 세대의 속성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그의 시가 영원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형도는 모든 사람이 본인과 가장 친했다고 회고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다정다감한 친구였다. 그의 시도 그렇다. 모든 사람이 그의 시를 읽으며 다정한 친구처럼 느껴지게 하는 힘이 있다. 보통의 시인은 쉽게 이르지 못하는 경지다. 윤동주와 김소월이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읽히듯, 훌륭한 시인들의 시는 계속 읽힌다. 형도의 시 역시 그럴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