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위의 시인이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회색 양복의 깃 아래로 곤색 모직 목도리가 살짝 드러나 보이고, 연한 하늘색 셔츠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옷차림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국제 시 축제 개막식에 참가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바로 전날 낯선 나라에 도착했고, 아직 이른 시각이었으므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집중하기는 쉬웠다. 낭송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마이크를 잡고 있지 않은 한쪽 손이 힘차게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주먹을 불끈 쥔 손이었다. 베트남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도, 그 순간, 시의 의미를 이해한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단어 하나 남지 않았지만.
문득 무대 위에 서 있는 시인이 4,50년 전에는 AK 소총을 들고 진흙투성이에 넝마 같은 군복을 입은 채 정글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미군 헬기의 사냥을 피해 숲속으로 몸을 숨기거나 수류탄을 들고 거미 구멍 속에서 매복하던 몸집이 작은 소년병이었을지도. 시인의 숱이 적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그러나 날카로운 눈매가 달리 보였다. 아마도 하노이로 날아오는 내내 읽었던 바오 닌(Bao Ninh)의 소설 ‘전쟁의 슬픔’ 때문이었을 것이다. 베트남이라는 이름 뒤에 한낮의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전쟁의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쟁의 슬픔’의 주인공 끼엔은 전쟁 때문에 부서져버린 사람이다. 자기 소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는 죽은 전우들뿐 아니라 자신이 죽인 여자와 남자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린다. “길가에 뒤섞인 악취가 갑자기 썩은 냄새로 변하고, 나는 1972년 섣달 끝 무렵의 어느 날로 돌아가 피비린내 나는 육박전 끝에 시신들이 즐비했던 ‘고기탕’ 언덕을 지나고 있다. 보도에서 풍겨 오는 죽음의 냄새가 너무 지독해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황급히 팔을 올려 코를 틀어막는다.....살인의 습관. 잔인한 피. 야수의 본능. 검은 의지와 목석같은 마음. 개머리판과 총검을 들고 싸우는 근접전의 광경이 불현듯 눈앞에 살아올 때면 야만적 흥분으로 어질어질 현기증이 일곤 했다. 가슴이 둥둥 북을 쳐 대고 나는 갈가리 찢긴 유령들이 시뻘겋게 터진 상처를 부여안고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계단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바오 닌, ‘전쟁의 슬픔’, 하재홍 옮김).”
지금 금테 안경을 끼고 무대 위에 서 있는 저 단아한 신사도, 한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개머리판을 휘두르고 방아쇠를 당겼을까. 시를 쓰고, 사람들 앞에서 시를 낭송하면서, 죽음의 악취와 살인의 습관을 깨끗이 씻어냈을까. 이따금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교활하기도 한 평화를 누리며 전쟁의 슬픔을 잊었을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바오 닌은 말했다. 불행히도 그는 전쟁을 알아 버렸다. 그건 비즈니스도 관념도 아니고, 누군가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치명적이고 세세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 날 오후 버스를 타고 서호 주변을 지나다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꽃송이들을 보았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온 영혼처럼 뽀얗고 섬세한 꽃들이었다. 저 꽃들은 매화일까, 협죽도일까, 하노이의 3월에 구름처럼 만개한다는 우유꽃(hoa sữa)일까. 시인이 낭송한 시의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나는 하얀 꽃의 이름을 끝내 알 수 없었다. 이름 모를 꽃, 끝나지 않는 슬픔의 진혼곡에 대해.
부희령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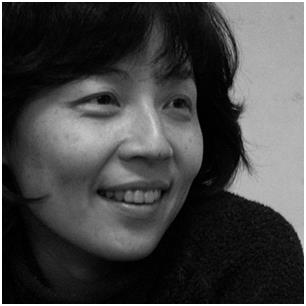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