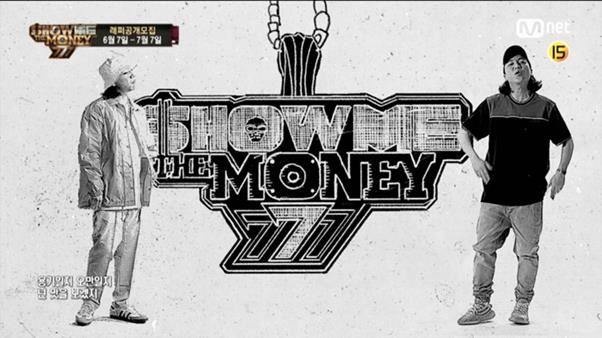
문학에서 언어를 가장 치열하게 탐구하는 장르가 ‘시’라면, 힙합은 음악의 ‘시’라고 부를 만하다. 지난 세기말 한 힙합그룹의 이름은 ‘거리의 시인들’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힙합은 과연 ‘시’처럼 읽힐 수 있을까? 시 전문 계간지 ‘파란’은 2018년 겨울호의 주제로 ‘힙합’을 내걸고 힙합과 언어에 대한 시인과 힙합 뮤지션의 고민을 실었다.
편집주간인 장석원 시인은 ‘누가 언어의 주인인가: 시 대(vs) 힙합’ 이라는, 여는 글에서 “조선 후기 민중의 구연/구술/연행 양식에서 예술로 이전된 판소리처럼 현재의 힙합 텍스트가 훗날 한국문학사나 구비문학사에 기록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장 주간은 시의 언어와 달리 힙합의 언어인 ‘랩’은 언어와 음악 두 가지가 있어야 존재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 주간은 그럼에도 “텍스트의 길이, 창작 주체, 향유 대상 등등과 무관하게 시와 랩은 언어예술이라는 공동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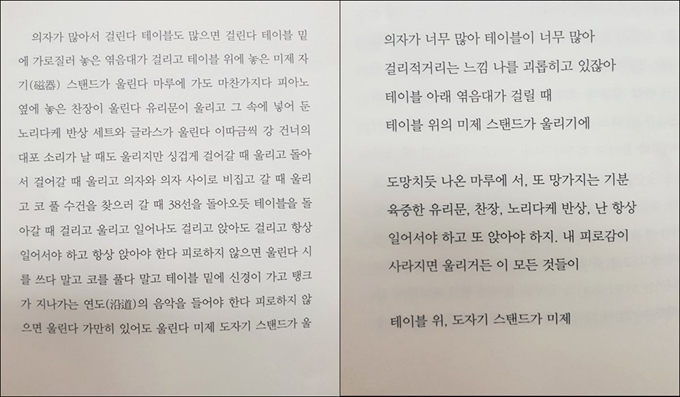
이어지는 글에서 힙합 뮤지션 김성재는 두 예술의 교차점을 발견하기 위해 시의 문장을 랩의 가사로 바꿔보는 시도를 한다. 그는 김수영의 시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를 랩 가사로 만들기 위해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기 △운율을 만들기 위해 ‘걸리다’를 ‘걸릴 때’로 대체하기 △’울리다’라는 단어를 소리 효과음으로 바꾸기 등의 시도를 하며 두 언어 예술의 차이점을 짚는다.
문학평론가 이병국은 “언어가 빚어내는 현실의 모습을 통해 음악을 듣는 청취자 혹은 시를 읽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점”을 들어 랩 가사와 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시인 김승일은 “힙합과 랩은 시 문학이 꺼리는 일들을 새로운 실험을 통해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도전과 투쟁 정신, ‘실천이 있는 문학’으로서 힙합을 분석한다.
책에는 이 외에도 이건청, 이관묵, 신동호 등 시인 14명의 시와 황봉구, 이진경의 비평도 함께 실려있다. 2016년 창간된 ‘파란’은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지금까지 총 11권호를 펴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