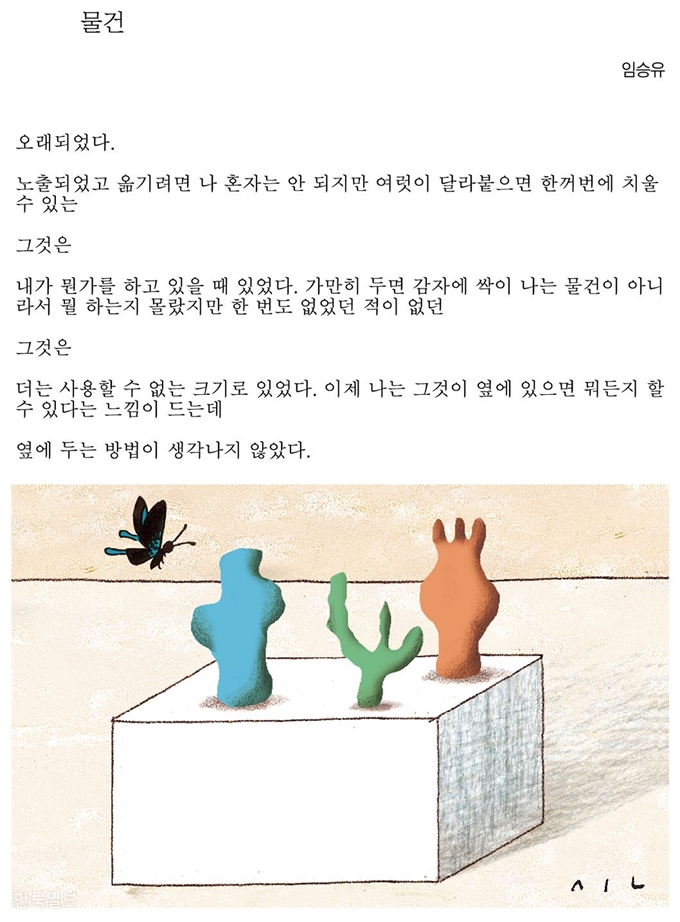
몇 번을 거듭 읽어도 간결한 리듬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 어렵지 않은 스무고개 같았는데, 답에 근접해가는 것도 같았는데, “그것은”으로 칭해지는 이 물건, 잡힐 듯 잡힐 듯, 직전에서 자꾸 미끄러지네요.
오래 같이 있어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았지만 스스로 뭘 하는지는 보여준 적이 없었다지요. 더는 사용할 수 없는 크기가 “그것은”이 다다른 곳이지요. 여럿이 달라붙으면 한꺼번에 치울 수 있다는 걸 보니 “그것은” 자체가 커졌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것은”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은”이라고 불릴 수 없는 존재가 “그것은”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무색무취의 이 물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용할 수 없는 크기는 어떤 크기일까요? 존재와 비존재 사이, 무심과 유심 사이, 밀착과 해방 사이에서 양가적 느낌으로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 물건이거나 물건의 성질을 갖게 된 무엇이겠지요. 이를테면 물건처럼 대하게 된 사람 말이죠.
물건이라 하면, 정물에 가깝고, 정물은 옮겨주는 누군가 있을 때 새로운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용할 수 없는 크기가 된 그것, 이제 그것이 옆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느낌에 다다랐지만 옆에 두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나의 아이러니. 용도가 있어야 물건인데 더 이상 물건이 아니게 된 그것, 물건이라는 단어에서 기어이 물건을 탈출시켰으니, 시의 언어로 물건을 구축하는 데는 대성공인 셈이지요.
이원 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