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그려진 그가 ‘어린 왕자’인 것은 틀림없다. 흐트러진 노란색 고수머리에 헐렁한 연미복을 걸친 채, 손잡이에 반원형 보호대가 달려 있는 길고 뾰족한 칼을 짚고 서 있다. 오래 전 읽은 책 속에서 본 그 모습과 완벽하게 같지는 않으나, 그린 사람이 무엇을 그리려 했는지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하다. 벽화 속에는 브로콜리를 닮은 나무들과 배춧잎처럼 겹겹이 꽃잎이 앉은 붉은 꽃들도 그려져 있다. 바오밥 나무와 장미꽃일 것이다.
나 또한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라, 인적 드문 이른 아침의 공원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아줌마일 뿐이다. 우연히 마주친 어린 왕자의 외모가 조금 곤혹스럽다 하더라도 마음에 거슬려야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없을지 모른다. 산책로를 따라 이어져 있는 벽화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나 지리학자, 술꾼도 등장한다. 가물가물 책의 내용이 떠오른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라든가,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다’든가, 해가 지는 광경을 좋아해서 슬픈 날에는 마흔 네 번이나 해넘이를 구경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내 인생의 책으로 꼽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린 왕자’는 꽤 깊은 인상을 남긴 책이었다. 하지만 2018년도 저물어가는 늦가을의 아침, 수도권의 서북쪽에서, 미세먼지 나쁨 경고를 무시한 채 산책을 감행하다 만난 어린 왕자는 왠지 기이하다. 기억을 더듬어 떠올린 책 속 구절들도 예전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 울림이 없다. 그런 말들에 대한 나의 느낌은 칠이 벗겨지고 지저분해진 벽화 속 어쩐지 구슬퍼 보이는 어린 왕자의 모습과 닮았다.
누가 여기에 그를 그려 놓았나. 누가 여기에 그를 그려 놓도록 했나. 부모 손을 잡고 공원에 놀러 오는 아이들, 그 순간만은 어린 왕자이거나 공주인 그들이 보기를 바랐던 것일까. 혹은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한때 어린 왕자이거나 공주였던 그들의 부모가 보기를 바랐던 것일까. 저 곤혹스럽고 구슬픈 어린 왕자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기를, 무엇을 떠올리기를 바랐을까.
책에서 말하는 것과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왜 다른 거야? 아들이 어렸을 때 자주 하던 질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된 그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다. 나 또한 살면서 어느 순간, 책과 진짜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허구와 현실의 차이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나와 내가 속한 세대는 성장하면서 점점 늘어난 물질적 사회적 풍요로움이 그런 차이를 보상해 주었던 경우다. 하지만 아들이 속한 세대에는 그 반대 방향의 경험을 하며 살아온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열일곱, 열여덟 나이에도 기꺼이 현장 실습에 나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아이들, 스쿠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배달 일을 해서 능력껏 돈을 버니 좋지 않느냐는 젊은이들, 대학 4년 내내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도 또 몇 년을 더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떠올린다. 그들이 평생 일할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가족을 꾸려 여유로운 삶을 누릴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공원 담벼락에 그려진 별, 나무, 장미꽃, 왕자나 공주 같은 남루한 허구는 한낱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다. 한때 빛나던 가치들은 광화문 한복판에 서 있는 왼손잡이 동상처럼 이제 아무것도 찬란하게 만들 수 없음을, 그들이 한참 전에 깨달았기를 바란다. 그것들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저 멀리 나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그럴 힘을 갖게 되길 바라며, 중년의 나는 건강을 위해 산책을 계속한다.
부희령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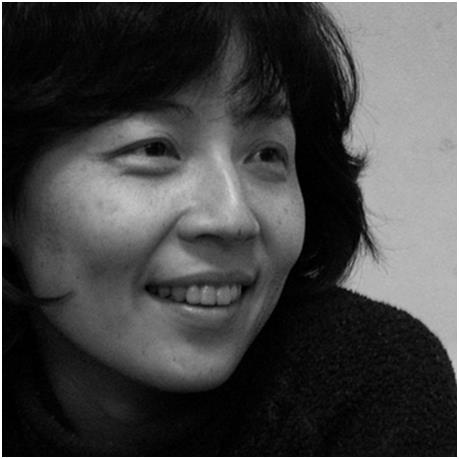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