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엔 정부가 기업의 투자계획을 적극적으로 파악했다. 보통 기업 주주총회를 전후한 3월경에는 연간 데이터가 나왔다. 산업자금 배분 창구로서 기업 위에 군림했던 산업은행이 국내 200대 주요 기업의 투자계획을 꼼꼼하게 수집해 두툼한 분석보고서를 내면, 정부도 그걸 주요 정책 자료로 썼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업 투자는 경제성장률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적 관심도 컸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엔 정부가 1월 초에 이미 기업 투자계획을 파악하곤 고심하고 있었다.
▦ 경기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서고, 우리 경제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세계화’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니 하며 외환 관련 규제가 풀려 기업의 외화 자금줄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거대 중국 시장이 서서히 부상하던 시기였다. 기업들은 21세기의 도약을 꿈꾸며 너도나도 설비 확장에 승부수를 걸고 있었다. 안 그래도 전 분기(1994년 4분기) 성장률이 무려 10%에 달했다. 잠재성장률 7% 내외를 훨씬 웃도는 과열이었다.
▦ 철강업계가 가장 공격적 투자에 나섰다. 아산만 철강공단 확장을 추진하던 한보철강의 1조6,000억원을 비롯해 포항제철 인천제철 동국제강 등도 앞다퉈 투자계획을 냈다. 그렇게 철강ㆍ금속 부문 투자예상액이 6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전력이 6조1,000억원, 반도체 5조7,000억원, 자동차 3조9,000억원 등 주요 대기업만 연간 30조원에 달했다. 재정경제원으로서는 기업 투자를 억지로라도 줄여야 했다. 금리인상, SOC 투자 축소, 시설자금 대출 축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됐다.
▦ 정부가 그렇게 기를 쓰고 말려도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서로 나섰던 게 불과 20여년 전이다. 지난해 LG를 시작으로 최근 포스코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대기업이 향후 5년간 400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기업 투자가 하도 불확실하고 저조하니까 대강이라도 희망적인 청사진을 내놓자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업을 돌며 투자를 ‘구걸했다’는 웃지 못할 보도까지 나돌았다. 정부가 옆구리를 찔러야 마지못해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오늘의 경제 현실이 착잡하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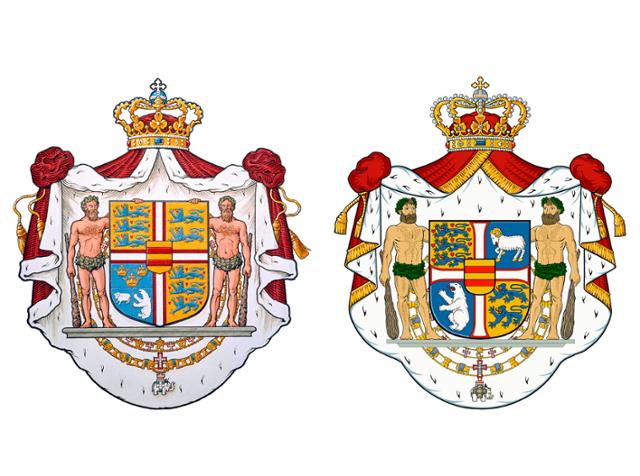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