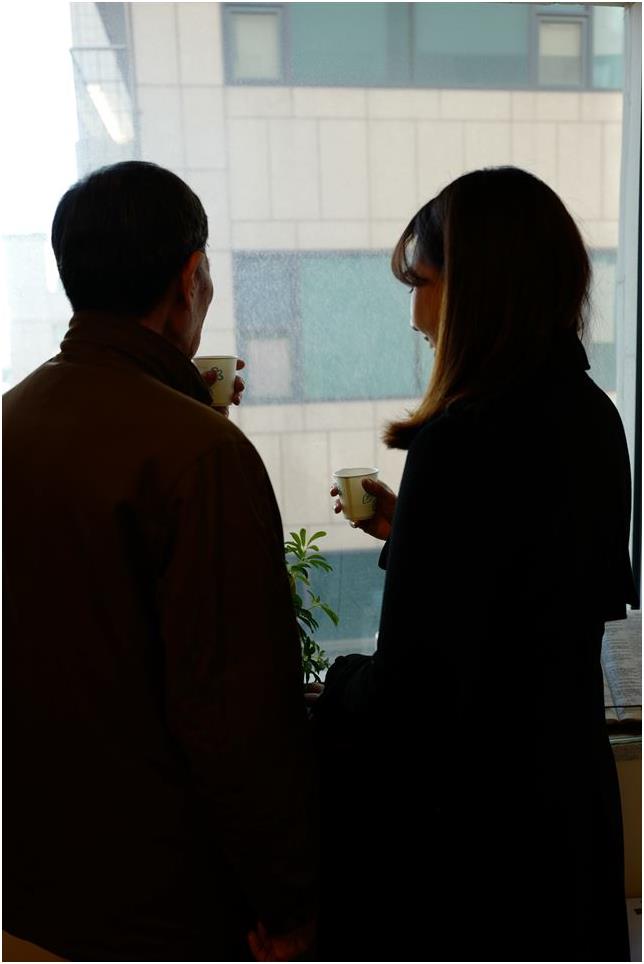
나(39)는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다. 스무살인 1998년 필로폰에 처음 손을 댄 뒤로 수도 없이 팔뚝 혈관에 주삿바늘을 꽂고 약물을 흘려 넣었다.서른살까지 꼬박 10년간 비참한 처지를 면치 못했다. 그런 나는 2008년 6월 죽기 직전의 폐인 꼴로 국립부곡병원(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지정기관)에 입원했다. 점잖은 아버지(81)가 참다 못해 “약 끊을 때까지 병원에서 나오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서다.
날 찌른 직설… 단약 결심
같은 병동, 같은 처지의 한 남자(당시 34세)가 어느 날 손편지를 내게 건넸다. 자기 아버지가 조직폭력배 출신 아들에게 띄운 글이었다. ‘네가 피를 보며 돈을 만지더니 마약까지 빠졌느냐. 아들아, 약만은 절대로 안 된다.’ 피붙이의 중독을 뒤늦게 안 부친의 탄식과 아픔이 곳곳에 묻어났다. 가슴이 찡했다. 그런 내게 사내는 나직이 말했다. “너네 아빠도 너 때문에 운다. 알고는 있어라.”
그는 주삿바늘 같은 직설을 더했다. 필로폰에 빠진 여자의 비참한 말로에 관한 얘기로 날 찔렀다. “네가 나이 들어서 돈은 없고 약은 더 하고 싶다면 어디로 갈지 아느냐. 결국 사창가다. 아니면 섬이든지.” 날 처음 본 날부터 시답잖은 말을 매일 걸었던 그는 내가 마약세계 밑바닥에서 투약의 대가로 남성들에게 이용 당해왔을 거라 짐작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자존심이 상하진 않았다. 이상하게 그의 말은 따뜻했다. 퍼뜩 정신이 들었다. ‘나이 들어서 정말 그리 되면 죽고 싶겠지.’ 나는 입원 한 달 만인 2008년 7월 집에 들어가 “이제 약 안 할랍니다”라고 선언했다.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네 말을 어찌 믿겠느냐’는 표정이었다.
나는 사내 말대로 휴대폰 번호부터 바꿨다. 툭하면 약의 유혹을 던지는 이들을 끊어냈다. 약 대신 집중할 거리를 찾았다. 휴대폰 부품을 받아 집에서 조립하는 월 40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했다. (권씨 아버지는 그때의 딸을 보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약을 끊을 가능성을 봤다고.) 생활 패턴도 뜯어고쳤다. 요가를 하고, 산책하면서 줄넘기하고 남들 잘 때 푹 잤다. 병원에서 만난 사내의 엄마가 중독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정리한 메모를 그 남자로부터 고스란히 전해 듣고 따라 했다. 마음이 불안정해질 땐 특정한 요가 자세를 취하라는 식이다. 그 남자는 여러모로 은인이다.
누명에 다시 주저앉았다
2009년 1월 연 매출 40억원 규모인 컴퓨터 제조업체 경리직에 취업했다. 작은 회사라 범죄경력조회를 요구 받지 않았다. 열심히 일했다. 나도 ‘직장이 있구나’ ‘평범하게 살 수 있구나’하며 점차 자신감이 붙었다.
하지만 2011년 경찰 수사관이 느닷없이 회사로 찾아오면서 절망의 늪으로 떠밀렸다. 경찰은 “회사 앞이니 내려오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누가 제보했다”고 했다. 당시 나는 3년 가까이 약에 손대지 않아 금방 오해가 풀리리라 여겼다. “제가 (마약 검사용) 소변을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경찰은 내가 범죄자라 확신했다. 한 수사관은 급기야 사무실까지 둘러봤다. 나는 사장님에게 “실은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는데 지금 경찰에 불려가야 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경찰서에서 당연히 내 소변은 음성이 나왔고, 검찰도 ‘혐의 없음’ 처리했지만 이미 짓밟힌 뒤였다.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도 남는다.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 나를 던진 것이리라. 마약에 절었던 내가 ‘여전히 하고 있겠지’하고 툭 찌른 것이다.
회사를 관둬야겠다고 결심했다. 월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만지던 내가 혹시 돈을 다 꺼내 약 사러 가지는 않을지 걱정할 까봐, 그게 미안했다. 사표를 냈다. 고맙게도 사장님은 반려했지만 그때 누명 사건으로 난 생채기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다시 이를 악물다
나를 다시 일으킨 건 평범함에 대한 갈망이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기억이 없던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컸다. ‘병원 남자’는 마약을 하면 안 되겠다는 강한 계기가 됐지만, 내가 약 대신 하고 싶은 게 생긴 ‘회복’ 상태에 이른 것은 바로 평범함에 대한 결핍, 그것을 채우고 싶은 갈망에서 비롯됐다.
우여곡절 끝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꿈을 키웠다. 2012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인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땄다. 시험 공부 전 크게 당황했다. 법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마약 중독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간절함만큼 불안이 커졌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과거에 그랬어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느냐’는 글도 썼다. 다행히 발목이 잡히진 않았다. 2014년 3월부턴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에서 1년간 수련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2급) 자격도 땄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마약 중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었다.
허나, 기쁨도 잠시, 시련은 또 왔다. 2015년 인천 모 병원에 취업한 지 2주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다. “윗사람에게 대든다”는 이유였다. 내게 소명 기회는 없었다. 나중에 그 윗사람이 마약 중독자에게 강한 선입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원 동료들은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포기를 모르는 아버지… 회복의 동반자
운이 좋게도 실직자 신세는 몇 달에 그쳤다. 다른 중독치료 기관에 몸담게 됐고, 때때로 서울역 앞 중독회복상담학교에서 내 아픔을 다른 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털어놓을 기회가 생겼다. 2년간 대여섯 번 나의 중독인생을 전했다. 직장암을 앓는 아버지는 매번 와서 지켜봤다. 아버지는 “체한 게 싹 내려가는 기분”이라 말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건 내 탓만 같다.
아버지는 재발도 마약 중독 치유의 과정 안에 녹아있는 것이라며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암도 그러하듯이 중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곁에서 인내해준 아버지가 있었기에 10년 넘도록 단약이 가능했으리라.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