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앞두고 ‘더 일할 권리’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 생계 부담 덜어 줘야 한다지만
보완책으로 풀지 않으면 과로사회로 역주행

1년 전 이 무렵,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7중 추돌을 일으키며 2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내는 대형사고가 있었다. 되풀이되는 졸음운전 참사였다.
차마 운전기사를 욕할 수 없었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50대 초반 운전기사의 업무일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5시간30분(나흘전)→18시간15분(사흘전)→ 휴무(이틀전)→ 18시간9분(하루전). 그리고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사고 발생시간인 오후 3시 무렵까지 내리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안다. 하루에 네댓 시간만 쉬지 않고 운전을 해도 급격히 몰려오는 피로감과 졸음에 ‘아차’하는 순간이 몇 번씩 찾아 온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그것도 단 하루가 아니라 매일 되풀이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사투의 연속일 것이다.
노선버스운송업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된 건 이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노사 양측이 합의를 한 경우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할 수 있는 26개의 특례업종을 지정해 왔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니 지금껏 버스업체들은 법 제59조를 ‘노동자 무한 이용권’으로 여기며 버스기사들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 온 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제 특례업종은 5개만 남게 됐다.
주 52시간제, 그리고 특례업종 축소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노동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2위를 다투는 ‘과로사회’ 딱지를 떼어 낼 이 역사적 순간,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뜻밖에도 근로자들에게 ‘더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더욱 뜻밖에도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막느냐”는 외침의 선봉에 선 건 버스기사들이다. 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 못 살겠다고 하나 둘 사표를 던졌고, 버스업계는 인력난에 발을 동동 구르며 노선 감축에 나서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로시간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와 닮아 있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일을 하겠다는 이들은 지금도 도처에 널려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보호막을 걷어 내는 순간, 노동시장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그들끼리 경쟁하면서 임금 착취의 굴레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랬다. “나는 덜 받고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개개인의 사정이 너무 절실하다고 해도, 그들에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다. 단지 최저임금 수준의 적절성이 문제일 뿐.
근로시간도 그렇다. 누군가가 더 일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더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옳은 걸까. 그렇게 허용된 무제한 근로가 노동자들을 근로시간의 노예로 만들어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이어 온 것이 아닐까.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담보로 하고 있는 버스기사 같은 직종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누군가는 아예 52시간제 계도기간이 6개월 만으로는 안 된다, 적어도 몇 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52시간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5일이니 휴일인 토ㆍ일에 8시간씩 16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막장 행정해석’으로 지금껏 우격다짐으로 버텨 온 게 68시간제일 뿐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부작용이 그리 간단치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업종별 면밀한 보완책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다. 사실상 유예된 6개월 동안 주52시간제를 다시 수술대에 올리자는 얘기가 나올까 겁난다. 더 일할 권리, 덜 받을 권리? 인정하지 않는 게 옳다.
이영태 정책사회부장 yt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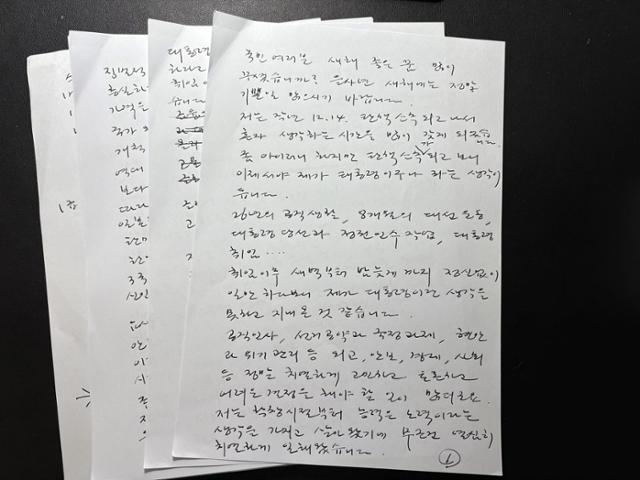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