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간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으로 ‘부탁한다’를 배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왼쪽에서 큰 소리로 ‘저요’라고 말한 철수(가명)가 답해볼까요?”
“‘거절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아주 잘 맞혔어요.”
분위기는 활발했다. 2명의 비장애인 보조교사가 도왔지만 수업은 앞을 볼 수 없는 유하진(32) 교사와 5명의 장애 학생들이 주도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개포동 개원중학교 개별 2반(특수학급)의 국어 수업 시간은 어색함이 없었다. 이날 교실에서 만난 유 교사는 ‘수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이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다 보면 수업 시간이 어떻게 가는 지도 잘 모른다”며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 아이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많다”고 웃었다.

6살 때 시력 잃어…임용고시 ‘4전5기’ 합격
유 교사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6살 때 동네 놀이터에서 갑자기 돌진한 덤프트럭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모래밭에서 놀고 있던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너무 어려서 그 땐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친구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보거나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 등은 또래 친구들에겐 혼자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에겐 다른 세상 사람들의 얘기였다. “교통사고 이후, 가족들의 보살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제가 어떤 모습인지 가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게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악몽이라도 떠올리는 듯, 그의 입가에선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다. 방황도 시작됐다고 했다. 특수학교 생활은 싫증났고 거칠어진 성격은 지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혼자서 많이 울었죠.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운명이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신체 장애 때문에 묻어두기엔 네 능력이 아깝다’며 끝까지 독려해 줬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4전5기’ 끝에 교단에 설 수 있었던 공을 선생님들에게 돌렸다. 장애인인 그가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선생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이젠 아이들에게 돌려줄 때”
그래서일까. 유 교사는 자신이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했다. 교사가 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한 ‘스승의 날’이 그에게 더 특별한 이유였다. 교육 철학 또한 분명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위치를 먼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각자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의 경험담은 수업 방식에도 적용됐다. “제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보단 소리를 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어요. 수업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낮춘 게 주효했다는 설명이었다. 서로에게 열린 마음은 잔잔한 감동도 가져다 줬다. “한번은 제가 실수로 교실 책상에서 음료수를 흘렸는데, 한 학생이 물 티슈를 건네주더라고요. 너무나 고맙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배웠으니까요.” 아이들과의 소통 일화를 전한 그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그는 장애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 붓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 콩나물이 자라긴 할까’ 의문이 들지만 결국엔 콩나물은 잘 자라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마다 자라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분명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 제가 할 일은 자양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글ㆍ사진=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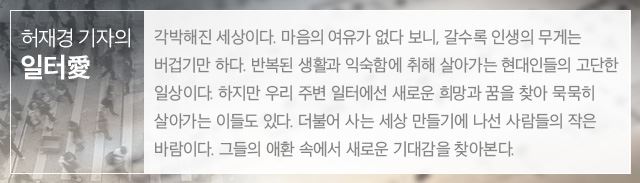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