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닥의 미친 속도를 견딜 수 없어
떠나거나 목소리를 잃어가는 기자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기자라서 좋았고, 기자여서 슬펐다.” 짧은 퇴사의 변을 남기고, 동료가 떠났다. 경력단절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겨오며 “만신창이가 된 커리어”(그의 칼럼 ‘오후 5시의 정치학’)에, ‘여의도’나 ‘서초동’ 근처엔 가보지 못했으나, 머리를 깨우고 마음을 흔드는 기사와 칼럼들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기자였다. 만 16년 달고 산 꼬리표를 모질게 떼어내기까지 겪었을 번민을 어찌 몇 마디 말로 헤아릴 수 있을까. 알면서도 어리석게 도대체 왜냐고 물었다. “이 바닥의 미친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나의 속도로 작지만 깊게, 천천히 오래 들여다보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지 못했다.
이 바닥의 미친 속도. 그가 화두처럼 남기고 간 이 말이, ‘미디어전략’이란 직함을 달고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쏟아내 온 내게, 화인(火印)처럼 가슴에 박혔다.
속도는 기자에게 숙명이다. 부연하자면 이런 것. “’최초가 된다’는 생각은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열쇠가 된다. (중략) 사실, 무엇 때문에 그 난리겠는가? 당신의 내면에는 최초가, 또 최고가, 아니면 가장 창의적이게 되려는 경쟁적 본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만약 후자라면, 언론계 직업은 꿈도 꾸지 마라.”(톰 플레이트, ‘어느 언론인의 고백’) 분초까지 다투는 특종 경쟁만 말하는 게 아니다. 기자의 업(業)인, 흩어진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진실을 찾아가는 일은, 제때 혹은 너무 늦지 않게 이뤄져야 빛난다. “언제나 동시대의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는 오멸 감독은 세월호를 다룬 영화 ‘눈꺼풀’의 뒤늦은 개봉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쪽 팔린 거다, 우리.”
속도의 숙명을 진 기자들에겐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캐는 스킬부터 엇갈리는(때로는 모두 거짓인) 진술들에서 참을 가려 내는 판단력, 정곡을 찌르면서 읽기 쉽게 전달하는 필력까지. 그러려면 끊임없이 훈련하고 공부하고 성찰해야 한다. 디지털 가속페달까지 단 속도의 숙명이 마구 등을 떠밀수록 더 자주 멈춰 서 좌표를 살펴야 한다. 방향을 모른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속도를 내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
숙명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이 범벅된 이 무서운 속도전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윤리의식도 필요하다. 내 눈의 들보는 감춘 채 남의 눈 티끌만 찾는 정쟁에 의미마저 퇴색한 도덕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지, 취재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지, 뉴스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충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일러주는 나침반으로서의 직업윤리 말이다.
현실을 돌아보면 아득해진다. 디지털 강화를 고작 ‘더 빨리, 더 많이’ 쓰기로 등치시킨 언론사, 댓글이나 공감수 조작을 방치한 네이버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실시간 검색어 장사’에 열 올리는 언론사가 여전히 많다. 대기업 사주의 ‘갑질’을 고발하면서 제 조직에서 벌어진 갑질에는 눈 감는 언론사도 적지 않다. 삼성그룹 사장에게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왔다” “무한 충성” “과분한 은혜” 따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문자를 보냈던 언론사 간부들이 제대로 사과하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격무와 불안한 미래, 추락한 자존감에 수치심까지 떠 안은 기자들은 저항하다 불이익을 받거나 속절없이 입을 닫거나 홀연히 떠난다. “기레기란 말에 상처받을 기레기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간 오직 기자들만이 기레기란 말에 상처받고 괴로워했을 것이다.”(소설가 박민규, 경향신문 칼럼)
미국의 기자 출신 교수 톰 플레이트는 위 책에서 ‘오늘날 저널리즘의 10대 죄악’으로 돈에 미침, 정파성, 특종 집착, 잘난 척, 경계 흐리기 등을 들면서 이렇게 썼다. “언론사의 목표가 비누 재벌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면, 왜 언론사가 수정헌법 조항 제1조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가?” 우리 현실엔 한 가지 더 보태야겠다. 뒤틀린 언론자유. “조직 내 비판과 반론(때론 잘못일지라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 언론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을까?”
“뭐가 달라질까? 희망이 있나?” 묻는 언론계 후배들에게 말하곤 했다. “변화와 희망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네가, 우리가.” 미안하다, 나도 10대 죄악(‘잘난 척’)을 저질렀다. 그래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이희정 미디어전략실장 jaylee2087@hankookilbo.comb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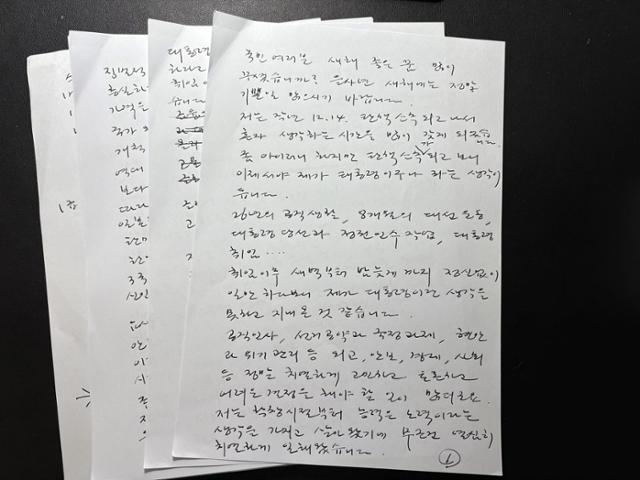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