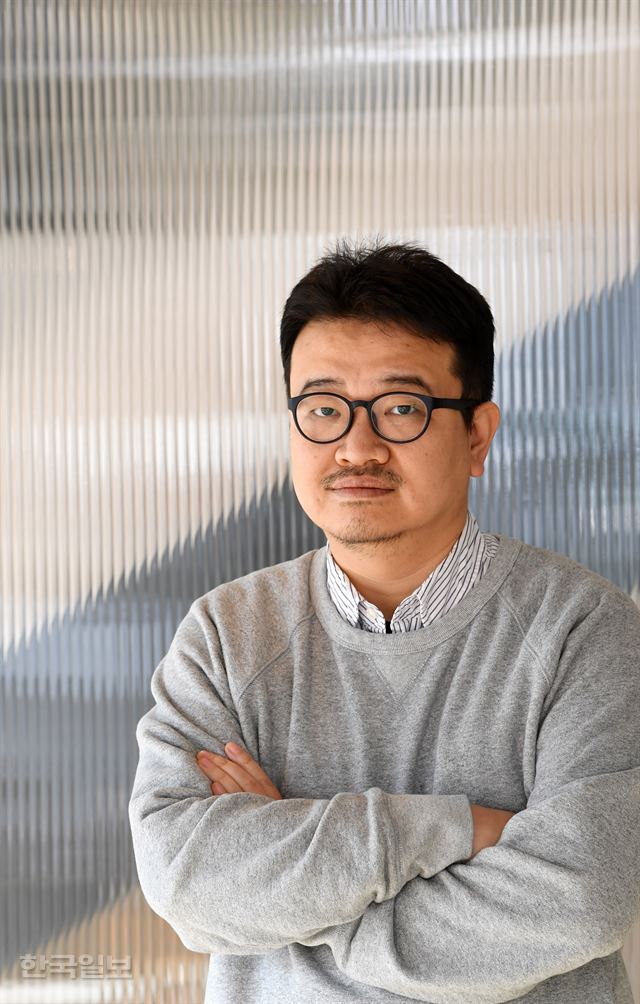
영화 ‘염력’이 그렇게 맥없이 기세가 꺾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12일까지 관객수는 98만1,273명(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관객 반응도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에선 ‘혼자만 당하기 억울하니 모두 영화를 보라’며 풍자적인 비판 댓글이 달렸고, 반대쪽에선 ‘그 정도로 저평가될 영화가 아니다’라는 옹호론을 펼쳤다. 악평이든 호평이든, 첫 실사영화 연출작 ‘부산행’(2016)으로 1,000만 홈런을 날린 연상호(40) 감독의 신작이라는 ‘기대감’에 판단 기준을 두고 있다.
스크린 밖 설전이 뜨겁지만, 최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마주한 연 감독은 의연했고 담담했다. “블랙코미디가 한국 관객에게는 낯선 장르예요. 기획 단계부터 흥행이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했어요. 당혹감이 없지는 않지만 크게 낙담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독립영화를 만들던 시절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요. 다만, 부진 원인에 대해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 감독이 대중성과는 거리가 있는 블랙코미디를 선택한 건, 이 장르가 지닌 사회 비판 기능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행’의 성공으로 주어진 기회에서 그는 뜻밖에도 ‘도시 개발’ 이슈를 꺼내 들었다.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였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달동네 강제 철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상계동 올림픽’(1988)부터 2009년 용산 참사의 진실을 추적한 ‘두 개의 문’(2012)과 르포 만화 ‘내가 살던 용산’ 등 관련 작품들도 놓치지 않고 살펴 왔다. “도시 개발로 인한 철거 문제는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소외돼 있어요. 도시 개발이 다수의 이익을 명분 삼아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철거민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인간성은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업영화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염력’에서 소시민 주인공은 우연히 갖게 된 초능력으로 철거촌 강제 진압에 맞서 가족과 이웃을 구한다. 용산 참사의 비극을 되돌리려는 영화적 의지로 해석되는 이야기다. 지난해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극장 상영관을 빌려 ‘두 개의 문’ 후속작인 ‘공동정범’(2018)을 배우ㆍ스태프와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연 감독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최소한의 판타지를 영화적으로 실현하되, 근본적인 의문은 남겨놓자는 게 영화를 만들며 견지한 생각”이라고 했다.

연 감독의 영화들은 서사가 탄탄하다. ‘돼지의 왕’(2011)과 ‘사이비’(2013) 같은 애니메이션영화에서도 실사영화로 손색없는 이야기라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염력’에선 “조금은 뻔해지더라도” 서사를 단순화했다. “사회 의식이 담긴 영화들은, 평소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만 봐요. 독립영화를 만들면서 그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상업영화라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영화가 어려워선 안 돼요. ‘염력’에선 도시 개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무심하게 흘렸던 풍경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연 감독은 “철거 문제를 100만명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했다. 또 “철거 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경직된 태도가 그 사건을 가장 빨리 잊게 만든다”며 “앞으로 더 많이 얘기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전히 연 감독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것도 그래서다. 그의 최근 관심사는 뭘까. “대중의 거대한 상처들, 그 심연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까, 회복이 가능하긴 한 걸까. 영화와 관계없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차기작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자 웃음이 되돌아왔다. “제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