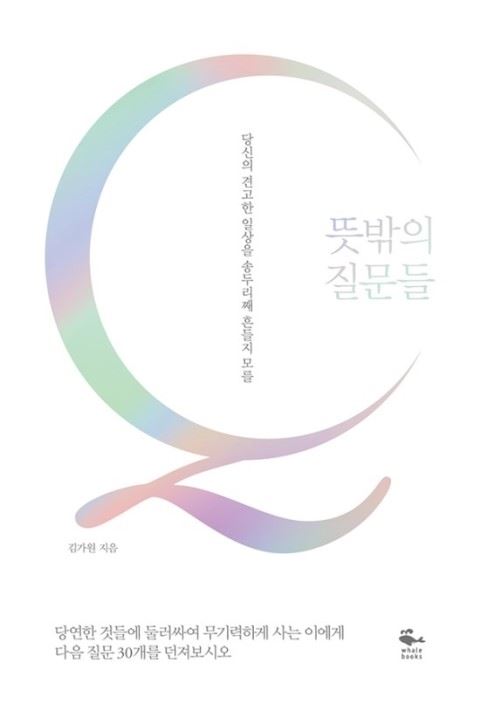
노벨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생전 “가끔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의문을 품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 덕분일까. 러셀은 논리학, 철학, 기호학, 사회학, 문학을 넘나든 자유롭고도 유연한 학자였다.
김가원 ‘마음해우소’ 대표가 처음으로 펴낸 책 ‘뜻밖의 질문’이 “30개의 질문들로 당신의 삶을 흔들어보겠다”는 도발적인 카피를 앞세운 이유도 다르지 않다. ‘사유의 자유’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책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느낀다고 여기는 감각과 욕망, 믿음, 진리에 물음표를 던진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이 넘어지면 물은 어떻게 될까? 물은 탁자에서 바닥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물이 아래로 흐를 것을 알았는가? 중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미래에 대해 100%확신할 수 있는가?”
파격적인 질문도 있다.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구현한 로봇과의 동거를 가정하고 이 둘의 다툼을 보여준다. 이후 ‘내가 로봇이랑 뭘 하는 거지?’라는 인간의 의문을 제시한다. 곧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미리 생각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엔 읽는 이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를 따라 답을 하다 보면 어쩐지 삶이 낯설어진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까? 흔히 사랑은 ‘느낀다’고 하는데 무엇이 느껴지는 걸까? 결국엔 사랑은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발짝 뒤에서 관망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사람들은 어른이 된 후부터 모든 것을 ‘원래’, ‘당연히’ 그러하다고 여기는 인식 때문에 더 이상 신기한 것도, 재미있는 것도, 궁금한 것도 없는 삶이 돼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질문하는 인간이야말로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책은 30개의 물음을 펼쳐 놓는다. 독자들은 질문에 따라갈수록 더 많은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저자는 다소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 속에 철학이 숨어있다고 강조한다.
저자 김가원씨는 서울대에서 철학과 동양화를 전공했고, 서울정신분석포럼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했다. 현재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에 소속돼 있으며, 1대1 익명 인문예술상담실인 ‘마음해우소’를 운영하고 있다.
홍인석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