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에 어떻게 매주 광화문에 나갔나 몰라. 어휴, 추워.”
강추위가 이어지는 이번 겨울, 사람들과 자주 나누는 말이다. 지난해 광장에선 여러 단체와 모임, 개인이 제작한 수많은 손팻말을 받았다. 각자 바라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구호가 적혀 있었다. 그 겨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당장의 목표는 같았다.
하지만 이후 꿈꾸는 세상에 대한 염원은 다 달랐다. 내가 꿈꾼 세상은 종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은 일상의 민주화와 일상의 정의를 위해 어떻게 애쓰고 있을까 궁금하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
<그건 혐오예요>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성소수자, 동물 문제에 천착해온 독립영화 감독들을 만나고 쓴 책이다. 한국 사회의 약자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을 계속 조명하는 작업을 해온 감독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동물 분야 이외에 다른 약자들의 삶에 대해 알고 싶었다. 차별의 이유가 다를 뿐 각자가 처한 처지는 비슷할 거라 생각했다.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잇달았다. 반대 이유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장애인을 대놓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고, 장애인 혐오는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성난 주민들 앞에 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다.

2017년에도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이 같은 장면이 똑같이 반복되는 걸 뉴스를 통해서 봤다. 이에 대해 장애인 관련 영화를 작업해 온 이길보라 감독은 말한다. “내 눈앞에 장애인이 있는 게 무조건 싫은 거, 보기 불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장애인은 차별을 당해도 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타자였다.
동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현상은 동물 문제에도 똑같이 재현된다. 무는 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와 산책하는 반려인들은 차갑게 노려보는 사람들의 시선 폭력과 “개새끼 끌고 나오지 마”라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물론 어떤 대상이 싫을 수도 혐오할 수도 있지만 그걸 공공연히 드러내고 물리적이든 언어로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와 동물단체가 추진했던 반려동물 중성화센터 개관이 최종 무산됐다. 나도 참여했던 사업이라서 실망이 컸다. 유기동물과 안락사를 줄이는 근본적인 접근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업이었다. 무산 이유는 센터가 설립될 지역의 주민 반대였다.
<그건 혐오예요> 속 인터뷰를 한 책 속 감독들은 약자 혐오의 근본 원인, 작동 방법 등에 대해 거의 똑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역사적, 정치경제적 여러 이유로 우리 사회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보수화되면서 당장의 분노를 퍼부을 약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정의와 평화는 그들만(이성애자, 남성, 인간, 비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이라고 규정짓는 무리)의 정의와 평화이고, 약자는 모멸감을 느껴도 내색하지 못하고, 못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게 된다는 것을. 사실 동물 문제도 여기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거나 여성이면서 이주 노동자라는 이중고를 겪는 약자들은 더욱 힘들다. 동물 문제도 마찬가지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남성이 고충을 토로하면 “어유, 남자들은 우리가 듣는 욕의 10분의 1밖에 안 듣는 거예요”라는 캣맘들의 말이 쏟아진다.

10여 년 전, 홈리스(homeless, 노숙자)의 자활을 돕는 잡지 <빅이슈>의 한국판 창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고 찾아가 한 동안 준비 활동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내 잡지 경력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는데 잡지의 창간 정신과 약자를 돕는 영리하고 선한 방식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 끌리게 되었다.
특히 외국의 사례처럼 홈리스가 반려동물과 함께 <빅이슈>를 판매하면서 자활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기를 기대했다. 반갑게도 국내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했던 판매원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편견에 결국 함께 거리에 나오는 것을 포기했다는 소식에 절망했다. 홈리스와 동물. 두 약자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지 짐작이 갔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말을 던지며 지나갔을지 답이 너무 뻔하지만 상상해보시기를.
판단 유보는 차별을 유지하는 것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서 ‘객관적’이라는 허울을 쓰고 판단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어정쩡하게 중립적 입장이라고 말하는 사람. 동물 문제에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많다. ‘나는 개를 먹지 않지만 먹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식이다.
성소수자 문제에 천착하는 이영 감독은 말한다.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은 현재의 차별을 유지하는 쪽과 같은 쪽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했다면 그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어 알리고, 그렇게 나도 남도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게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가 벌이는 일상 투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도서: <그건 혐오예요>, 홍재희, 행성B잎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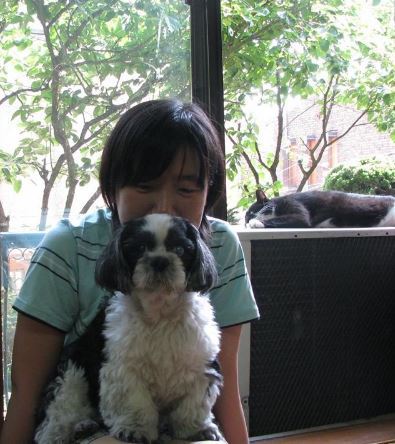
김보경 책공장더불어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