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10년 동안 120조원 투입
여성의 결혼 기피 늘어나며 효과 반감
성평등 확대 등 새로운 접근 강구해야
일본 언론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즐겨 인용하는 외국 학자 중 에마뉘엘 토드라는 프랑스 역사인구학자가 있다. 그가 최근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기자가 물었다. “일본에서는 젊은층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답은 이렇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육아나 교육 지원이 충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는다. 학생 시절 출산도 드물지 않다.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가족 부담이 무거워진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부담이 과도해서 (저출산이) 심각하다. 일본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육아에 대한 가족 부담이 무거우면 결국 가족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일본 기자가 일본 문제를 물었는데 대답에서 한국이 먼저 언급되다니. 토드의 한일 인연이라면 이처럼 취재를 받거나 자신의 책이 번역되었을 때 정도일 것이다. 그의 책은 일본에서 20여권 번역되었지만 한국은 고작 3권 정도다. 그의 뇌리에는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유사하고 그 중 한국의 저출산이 더 인상적으로 각인됐음에 틀림없다. 한국은 출산 가능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1.17)이 OECD 최저 수준이고, 16년 연속 초저출산율을 기록 중이니 이상할 것도 없다.
물론 이 문제에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운 게 2006년이다. 3차 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년간 투입 예산이 190조원에 가깝다. 그런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지금까지 대책이 정확한 처방이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도로 충분하느냐는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엊그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새삼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배경에 있다.
그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타깃으로 삼은 주요 정책은 고용ㆍ주거 불안 해소,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개혁을 통한 보육ㆍ교육 인프라 구축, 임신ㆍ출산ㆍ돌봄 관련 지원 등이다.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나 주로 결혼한 가구에 한정된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의 2005~2012년 출산율 변화 요인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결혼 여성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해 출산율을 거의 0.33 정도 낮췄는데, 대신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이 늘어 출산율을 약 0.44 높였다고 한다. 늦어지는 결혼, 여성의 결혼 회피 경향 등이 저출산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얘기다. 정부 주변에 이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지만 대책이라고 머리를 짜내는 것이 교육 기간 축소 등 엉뚱하다 못해 젊은이들의 반감마저 살 만한 것들이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성평등 실현을 출산율 저하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보고 여성 고용률이 60%(현재 50%)를 넘어서면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이 성평등 사회로 진입해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서 한때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며 출산율이 U자를 그리며 증가한 사례를 든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상식인데 여전히 풀지 못한 경단녀, 유리천장, 독박육아 등의 문제가 결혼의 장애물임을 생각하면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다만 여성고용률 증가와 함께 유럽 복지 선진국처럼 기존의 저출산 대책도 더 두텁게 가져가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누구도 섣불리 소련의 미래를 얘기하지 않던 1976년 인구학 통계치를 다양하게 인용해 그 제국의 몰락을 내다본 ‘최종 붕괴’로 유명한 토드는 앞서 인용한 인터뷰에서 농담을 섞어 가며 이런 말을 남긴다. “프랑스는 정치인들이 모두 무능해 경제도 치안도 나쁘다. 하지만 프랑스는 다음 세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 후에도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알 수 없다.”
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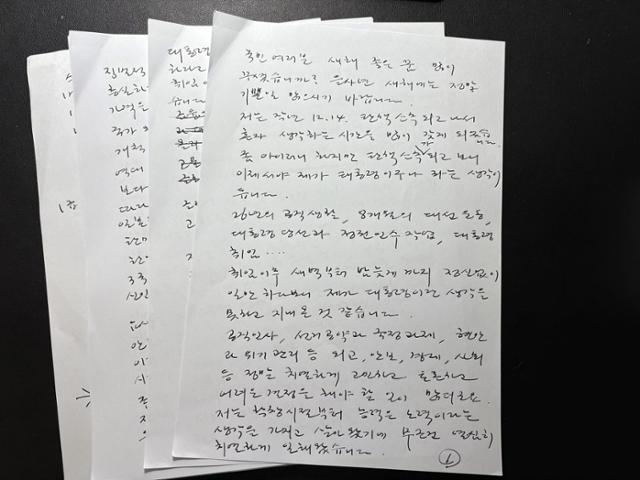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