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완전히 궤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분노와 복수의 난무는 병든 사회 증후군
권력과 정의 모두 독점하려니 불통 된다
정치 권력은 왜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예 정복을 하려 들까. 정적들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야 장기집권도 가능하기 때문일 게다. 전쟁이나 조폭의 패싸움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집권했다면 행태가 좀 달라야 한다. 반대표를 던진 절반 가까운 국민과 정치세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게 화합이고 통합이고 협치다. 정권만 잡으면 칼자루는 물론 정의까지 독점하려 드니 불통(不通)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정권도 없다. 같은 진영이 권력을 승계해도 이전 권력에 대한 안전보장은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레임덕이 점점 빨리 온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칼자루’를 쥔다. 칼을 직접 휘두르는 검찰은 정권의 용역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전ㆍ현직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국회 언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침이 없다. 정권과 검찰의 결기가 섬뜩하다. 어찌 보면, 응시하는 지점이 2009년 5월의 어느 토요일인 듯하다. 이번 정권이 한 맺힌 지점이고, 명분은 적폐청산이다. 태광실업 효성 댓글공작 등을 연결하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는 사슬이 완성된다. 새 정권 출범과 함께 반복된 패턴이라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그래서 세상이 좀 나아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런 패턴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총탄에 맞거나 자살했다. 일부는 자식이나 형이 구속됐다.
잘못이 있으면 죄를 받아야 한다.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관전자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여러 군데 있다. 과거청산과 정치보복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공격과 방어가 뒤바뀐다.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들이 이처럼 불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도 예측할 수 없다. 분노 복수 오기 광기의 난무는 병든 사회 증후군이다.
그래도 이번 정권만큼은 도덕적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마저 빗나갔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각료 임명과정을 보면 정권의 도덕성은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판명됐다. 아무리 봐도 고리를 잘못 끼웠다. 부적격자가 속출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권의 오만이거나 국회와 국민 모독이다. 부적격자들이 장관을 더 잘한다는 어이없는 가설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어디 감방에서 골라보지 그랬나.
혹시나 기대했던 통합 화합 협치 등은 말뿐이다. 상대를 어르고 달래는 전략도 없다. 그리고는 노무현 정권의 구닥다리 인물들을 각종 협회장 자리에 앉혔다. 그들은 “10년을 굶었다”며 염치없이 자리를 꿰찼다. 여기에 전문성도 없는 캠프 인물들을 공공기관장에 꽂아 대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청산한다더니, 외려 낙하산 행렬로 적폐를 쌓고 있다.
제임스 F. 웰스는 저서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에서 집단사고의 맹목성을 비판한다. “집단 획일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무적의 존재, 언제나 옳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일단 스스로를 도덕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면 집단 내에서는 누구도 그 기본 신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사악하고 나약하며 어리석은 적으로 간주해 적대시하고, 정책과 상충하는 데이터들은 무시해 버린다.”
권불오년(權不五年)이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했다. 그동안 누군가는 쓸개를 씹을 것이다. 지금이야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정권과 검찰이 늘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을 겨냥하다 말기로 갈수록 현 정권을 겨냥하게 마련이다.토머스 홉스
는 ‘리바이어던’에서 통치자의 요건 두 가지를 말했다. 첫째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 둘째는 국민의 동의다. 그러나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은 승리(victory)일뿐 정복(conquest)은 아니라고 했다. 곰곰이 되새겨 볼 말이다.
조재우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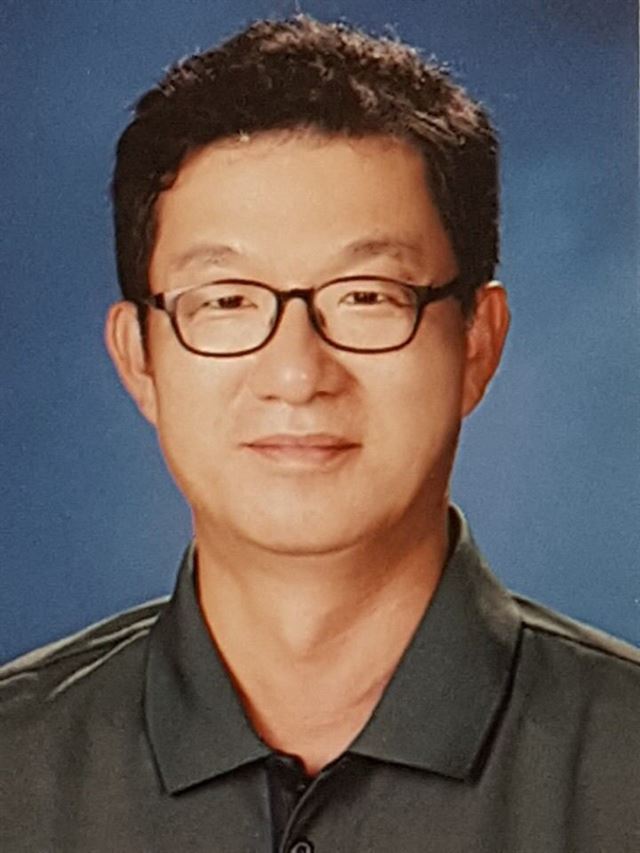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