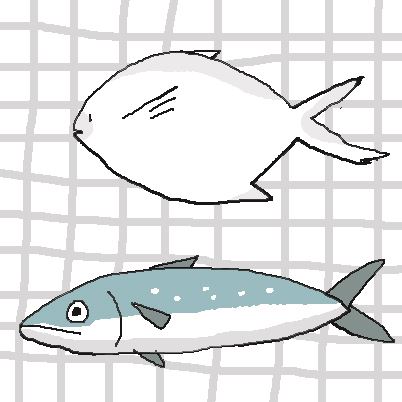
흔히 음식은 추억이라고들 한다. 얼마 전 집 근처 재래시장 좌판에 나온 병어를 보고 잠시 추억에 젖은 적이 있다. “병어 주둥이, 메기 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이 작은 병어는 납작한 마름모꼴 생선이다. 섬에서 태어나 생의 절반을 그곳에서 보내고 나머지 절반도 바닷가 도시에서 보낸 부모님은 봄 여름 병어철이면 어김없이 병어회를 내주었다. 작가 이순은 단편 ‘병어회’에서 “그 하얀 빛이 튀던 칼날” 등의 표현을 써가며 병어회 뜨기를 설명했지만 실은 병어를 뼈째 썰기 때문에 회로 만들기는 쉬운 편이다.
▦ 병어회를 줄 때마다 부모님은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삼치, 고등어처럼 살이 무른 생선회는 간장이 좋지만 병어처럼 단단한 생선회는 된장에 먹어야 제 맛이라는 것이었다. 시인 안도현은 시 ‘병어회와 깻잎’에서 군산에서는 병어회를 깻잎에 싸먹는다 했지만 우리는 깻잎이 아니라 된장이 중요했다. 다른 하나는 병어만큼은 큰 놈을 먹으라는 것이었다. 병어는 살이 적기 때문에 크고 두툼해야 제대로 맛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장에 나온 병어는 크고 두툼하기는커녕 길이가 10㎝가 채 안될 정도로 작았다.
▦ 남도의 바닷가에서는 커다란 병어를 덕자병어 또는 돗병어라 하고 아이 손바닥만한 작은 병어는 자랭이라고 부른다. 그날 재래시장에서 자랭이를 직접 보았다면 그 며칠 전에는 수북이 쌓인 고도리 즉 고등어 새끼를 신문과 방송에서 보았다. 전국 최대의 고등어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 나온 고등어 중 80~90%가 볼펜 크기, 심지어 라이터 크기 밖에 되지 않는 새끼라는 것이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는 포획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렇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니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 셈이다.
▦ 수산업 관계자들은 만약 어린 고등어를 두세 달만 더 놓아두면 훨씬 크고 맛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다가 ‘국민 생선’ 고등어마저 고갈되고 그래서 수입산에 의존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많다. 병어든 고등어든 자라지 못한 물고기를 마구잡으면 결국 어자원이 고갈될 테니 생선 씨를 말린다고 중국 어선만 탓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물고기라 해도 어린 녀석을 저렇게 잡아들이는 것은 생명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때 보았던 자랭이와 고도리가 저 넓은 바다를 제대로 누벼나 보고 잡혔는지 궁금하다.
박광희 논설위원 kh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