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소기업은 354만 2,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한다. 종사자 역시 1,402만 7,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7.9%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거나 받고 있는 제조업ㆍ벤처 분야 중소기업 1,57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1%인 332개가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5년 뒤 생존율도 30%에 불과하다.
한국의 자영업은 지난 10년 간 1,008만 명이 창업했으나 20%인 202만여 명만 영업을 하고 있다. 806만여 명은 모두 폐업했다. 지난해도 창업자는 110만 명, 폐없자는 83만9,000명이었다. 이들의 파산은 자금력 부족과 높은 임대료, 그리고 과잉 경쟁구조가 주된 이유다. 현재 수도권 요식업의 60%가 적자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고, 5년 뒤 살아남을 확률은 겨우 16%다.
반면 한국 대기업은 12.8%의 고용 비중으로 총 부가가치의 약 56%를 가져간다.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56%로 한국과 같은 미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58.7%에 이르는 데만 비추어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한국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의 약 41.3%로 임금격차도 너무 크다. 이처럼 한국의 대기업은 고용 비중은 낮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큰 게 특징이니, 우리나라를 대기업 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양극화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연 100조원의 매몰비용을 쓰고 있다니, 가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무덤이라 할 만하다.
잇따른 논란을 부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는 오래 전에 예고된 것이었다. 이런 문제를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거쳐 서울우유 협동조합처럼 하루 빨리 협동조합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년 5월에 ‘부패와 경제성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 회원국 평균만 유지해도 한해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구 결과는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기 4년 전에 이미 우리사회 갈등지수의 주요 원인인 부패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 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양극화 환경에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쟁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개인창업은 더욱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신자유주의체제에서 무모한 ‘나 홀로 창업’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 지도층과 기성세대의 공유경제에 대한 편견과 무지다. 현재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고위공무원 또는 정치권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중소기업 중 30%만 활용)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투명한 지원계획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여야 할 조합기업 구축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계속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두고 있어, 창업자는 창업절차가 간편한 소상공인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창업진흥원에 연간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지원해 매년 2,000개의 창업기업을 만들어 나가듯, 조합기업의 구축을 위한 공유경제진흥원 또는 조합경제진흥원 같은 연구소나 재단을 만들고, 중소기업과는 별도의 지원펀드를 통해 조합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 유통, 마케팅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험천만한 개인창업을 억제하고, 되풀이 되는 혈세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3차 산업혁명의 선물인 공유경제를 이루고, 매년 100조원 이상을 낭비하는 무모한 개인창업 도전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순철 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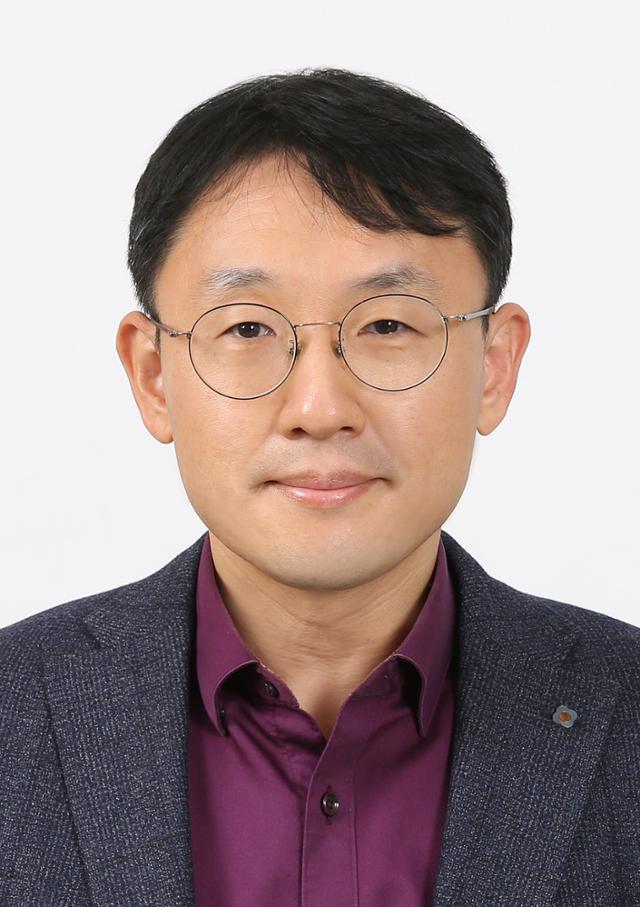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