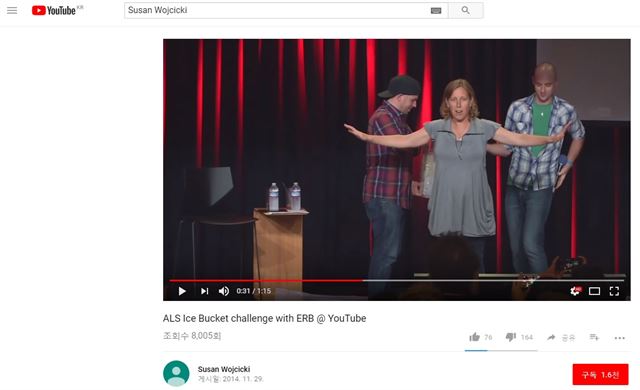
유튜브의 성장사는 동영상 플랫폼 전쟁사나 마찬가지다. 작은 벤처에서 시작한 유튜브는 끝없는 전투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쟁취하며 성장해왔다. 첫 상대는 구글이었다. 구글은 2006년 유튜브를 인수하기 전 구글 비디오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막강한 이용자 기반을 갖고도 동영상 플랫폼을 제대로 키우는데 실패한 구글은 신생 벤처 유튜브를 마치 무릎을 꿇듯 높은 값어치로 인수했다.
최근 10여년간 유튜브는 다양한 적들과 전투를 치렀다. 중요한 전쟁터 두 곳에서 유튜브의 경쟁력을 가늠해보자. 첫 번째는 전통 미디어 진영과의 끈질긴 싸움이다. 2007년 음악전문 케이블채널 MTV를 소유한 미디어그룹 바이어컴이 유튜브를 상대로 10억달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것이 선전포고였다.
전통 미디어 진영도 온라인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 훌루를 통해 돌격해왔다. 훌루는 2007년 디즈니와 뉴스코퍼레이션, NBC유니버설 등이 합작해 만든 플랫폼이다. 콘텐츠의 양과 이용자 기반에서는 유튜브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유명한 전통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콘텐츠를 등에 업은 훌루의 기세가 대단했다. 그러나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TV가 출현했고, 방송사업자들은 자체 플랫폼과 스마트TV라는 양쪽 사업모델 사이에서 혼란과 알력 다툼을 겪었다. 훌루는 월정액 구독 모델을 도입하며 자구책을 강구했고, 현재까지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튜브의 아성을 허물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을 필두로 한 뉴미디어 사업자들과의 혈투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모바일 시대에서 페이스북과 스냅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유튜브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현재 동영상 전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전면전이라 할 정도로 페이스북의 도전이 거세다.
페이스북의 동영상 시장 진입은 ‘스며들기’ 전략이라 칭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타임라인에 동영상 노출을 늘여가면서 무음 모드로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도록 했다. 이용자 저항이 적었고 자연스럽게 동영상 소비가 늘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비디오 퍼스트(Video First)’를 천명했다. 생방송(라이브)을 주요 무기로 유튜브를 정면 겨냥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드라마 ‘하우스오브 카드’와 최근 화제가 된 영화 ‘옥자’처럼 자체 제작 콘텐츠로 전세계에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북미권 이용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진ㆍ동영상 공유 서비스 스냅챗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동영상 서비스 ‘스토리’로 지분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도 유튜브의 헤게모니는 굳건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한동안 그럴 것으로 전망한다. 독자적인 콘텐츠 생산과 유튜브 레드 등 유료구독모델 도입, VR(가상현실) 등 신기술 대응과 생방송 활성화 등 다양한 시도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생태계를 일궈낸 플랫폼의 힘이다. 이는 공유경제를 표방한 우버와 에이버앤비의 성공 사례를 짚어봐도 알 수 있다. 자동차와 숙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도 의미 있는 사업자로 성장한 우버와 에이버앤비 사례처럼 플랫폼을 매개로 서로 다른 집단을 이어주는 ‘양면시장’에선 연결의 가치가 무척 중요하다. 유튜브는 경쟁자들보다 훨씬 먼저 창작 네트워크와 이용자 커뮤니티 양쪽을 가꿔오면서 생태계를 조성했다. 그 생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자라나고 있다.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